
동양에도 산타클로스가 있다. 중국 당나라 말기의 승려 포대화상(布袋和尙)이 주인공이다. 그는 일찍 출가해 불도를 성취했다. 신통력도 있어 길흉화복이나 날씨 등을 예언하는 데 틀리는 법이 없었다. 저잣거리에서 생활하며 항상 큼직한 자루를 메고 다녔는데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탁발해 얻은 물건을 포대 안에 넣고 다니다가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나에게 포대 한 자루가 있으니/허공에 걸림이 없어라/열면 온 우주에 두루 펼쳐지고/오므리면 스스로 있음을 보노라.'(포대화상의 게송)
포대화상의 풍만한 살집과 불룩 나온 배, 웃는 얼굴은 중국인들을 매료시켰다. 중국인들은 포대화상을 미륵불의 화신으로 추앙했다. 중국 사찰 중에는 입구에 포대화상을 모신 곳이 많다. 그가 복(福)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1천 년이 흐른 뒤 포대화상은 대구땅에 '환생'한다. 1960년 4월 대구의 주류회사인 삼산양조(오늘날의 금복주)가 희석식 복주(福酎)를 출시하면서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복영감'의 모델이 포대화상이다. 술 주머니와 부자 방망이를 손에 들고 술통 위에 좌정한 복영감은 달마대사와 인도 대흑신(大黑神)의 전래 이미지를 차용했는데, 그중 포대화상의 이미지가 가장 강했다.
복영감을 내세운 복주는 공전의 성공을 거뒀다. 삼산양조가 회사명을 금복주로 바꿀 정도였다. 대구'경북 기성세대치고 '금~금~금복주, 최고 소주 금복주'로 시작되는 1960, 70년대 CM송을 모르는 이는 없으리라. 특이한 것은 금복주의 한자 표기 마지막 글자가 '酎'(술)가 아니라 '珠'(구슬)라는 사실이다. "자기들 소주에만 복이 있고 우리 소주에는 없다는 말이냐"라며 당시 경쟁 업체가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酎'자를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설립 이후 60년간 탄탄대로를 걸어온 금복주가 요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직원 성차별 고용 논란에 이어 임직원의 협력 업체 금품 수수 등 바람잘 날 없다. 지역 소주시장 점유율도 크게 떨어졌고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 김동구 회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지만 소비자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금복주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향토 기업의 추락에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는 않다. 금복주로서는 포대화상의 신통력에라도 기대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뼈를 깎는 수준의 쇄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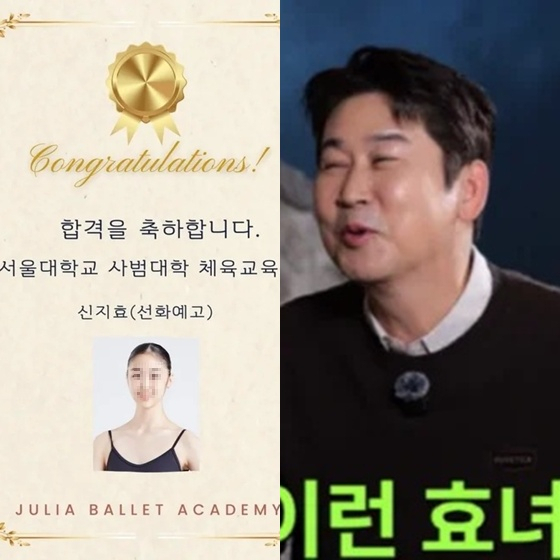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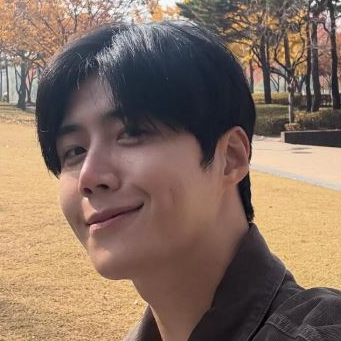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