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릉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다. 석유램프를 끄고 이불 위에 쓰러진다. 몸이 부르르 떨린다. 백짓장 같은 게이샤들의 흰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들에게 유곽으로 보내겠다고 윽박지르던 박중양의 음성도. 그 말을 들은 게이샤들의 표정이 어떠했지? 노래를 부르듯이, 하이 하이, 어쩜 그렇게 수긍할 수 있을까?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까닥거리며 말이야. 히로시마에서 부산을 거쳐 대구로 왔다던가. 기껏 창기짓을 하다가 게이샤처럼 꾸몄겠지. 그런데도 그녀들의 가벼운 응수에는 묵과할 수 없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금릉은 게이샤들의 부드러운 자신감이 무서웠다. 성이 무너지고 게이샤들이 끊임없이 몰려온다면 어떻게 되지?
허벅지에 착 달라붙는 기모노. 큰 목단 꽃잎과 자잘한 벚꽃으로 어우러진 무늬가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그려진 비단옷. 복부를 감고는 등 뒤로 큰 매듭을 지은 황금빛 오비도 여간 요염하고 세련되지 않아. 우리 옷은 촌스러워. 펑퍼짐한 치마에 괴죄죄한 저고리라니…… 언제부터 눈(目)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구역질났던 게이샤의 모습이 언제부터 요염하게 보였을까? 금릉은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침부터 날이 끄느름하다. 조금 열린 문틈으로 초겨울 찬 공기가 들어온다. 금릉은 경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본다. 이즘 들어 얼굴에 뾰루지가 돋는 게 화장을 두텁게 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장에 나가볼 참이다. 아까 아침밥을 먹을 때 앵무 아주머니가 시장에 가서『혈의 누』란 신간 소설이 나왔으면 사달라고 부탁했다. 늦가을 대시에는 책을 파는 상인(서괘, 書儈)들이 심심찮게 다녔다. 평소 오일장에도 책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오지만, 가을 대시에는 신간이나 중국책까지 어렵잖게 살 수 있었다. 겨울은 아랫목에서 책 읽기가 그만인 계절이다. 앵무 아주머니는 책을 좋아했다. 마루에 앉아 가을볕을 받으며 책을 읽을 땐 불러도 모를 판이었다. 앵무 아주머니의 이름은 염농산이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관기 시절에는 수많은 선비들을 애태웠다고 한다. 영조임금 이후로 대구에 앵무라고 이름을 붙인 빼어난 기생이 전설처럼 이어져오는데 지금 염농산 아주머니가 전설의 마지막 분이다. 물론 언제 또 앵무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염농산 아주머니는 황진이나 동인홍처럼 시를 잘 지었고 곧은 성품은 평양의 계월향이나 가산의 연홍에 견줄 만하다는 것이다. 금릉은 염농산의 시 몇 편을 알고 있었다. 남녀의 희롱에도 단아한 멋이 있고 그리움이나 분노에도 넘치지 않는 절제가 어려 있다고, 기루에 온 손님들에게 얘기를 들었다.
"비가 오면 책을 꼭 품에 넣어야 한다."
우산을 들고 금릉이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염농산이 한 마디 이른다. 예, 한 방울도 안 묻게 할 거예요, 대꾸하고 골목으로 나온다. 기루가 전동에 위치해 있어서, 큰시장으로 가려면 달서문(성의 서문)과 통하는 삼거리로 쪽을 택하거나 개천 쪽으로 가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서 달서교를 건너야 한다. 달서교를 건너면 곧 큰시장이다. 그녀는 개천으로 방향을 잡는다.
대시가 열린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개천 재방은 한산했다. 지난해만 해도 사람들이 많아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큰시장에서 자리를 못 잡은 상인들이 개울 건너편까지 올라왔다. 갖가지 면포와 곰과 호랑이의 모피를 가져와서 파는 중국상인들도 부지기수였다.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개천 재방 위로 왕버들, 붉나무, 이팝나무들이 입을 떨구고 호젓하게 늘어서 있다. 상인들이 마소를 묶을 기둥으로 쓰려고 먼저 차지하겠다고 법석 떨던 나무들이었다. 달서교 가까이에 있는 느릅나무 한 그루에만 노새가 묶여 있다.
금릉은 달서교 앞 사거리에 서서, 멀리 서문을 바라본다. 곧게 뻗은 길 끝에 누각이 서 있다. 출입하는 사람들 사이로 둥근 성문도 시야에 들어온다. 무너지지 않았네. 금릉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집에서 개천 쪽으로 에둘러 온 것도 성곽을 보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젯밤에 성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다.
한산한 대시와 무너진 성곽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왠지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짚이지 않는다. 금릉은 열 살 무렵에 옷을 지어서 팔던 일을 기억했다. 내가 만든 무명옷이 인기가 많았어. 10승을 넘게 짠 옷은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다른 애들도 노리개 몇 개를 놓고 장사를 했잖아. 그것도 없는 애들은 자기 집 창고 돌쩌귀를 뽑아서 내다팔았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상인이 되었어. 술집은 밤새 홍등에 불을 켰고, 기루의 대문 앞에도 차례를 기다리는 돈 많은 중국 상인들이 뿜어대는 담배연기가 자옥했어.
큰시장으로 들어서는데 진눈깨비가 내린다. 금릉은 손을 내밀었다. 비에 섞인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진다. 첫눈이야. 진눈깨비라 해도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노점들이 천막을 친다. 그릇 장수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등에 걸친 삿갓을 머리에 쓸 뿐이다. 금릉은 우산을 펴든다.
"책 파는 사람 봤어요?"
금릉이 길가 벚나무 밑에서 진눈깨비를 피하는 사람에게 묻는다.
"저 안쪽으로 가 봐요."
"북후정까지요?"
"아니 조금만 가봐."
허름한 상투잡이가 장옷을 걸친 금릉에게 음흉한 눈을 흘끔거린다. 장옷을 입었으니까 양반집 규수인가 싶다가도 왜색 우산을 쓴 것을 보고 금세 금릉의 신분을 알아챈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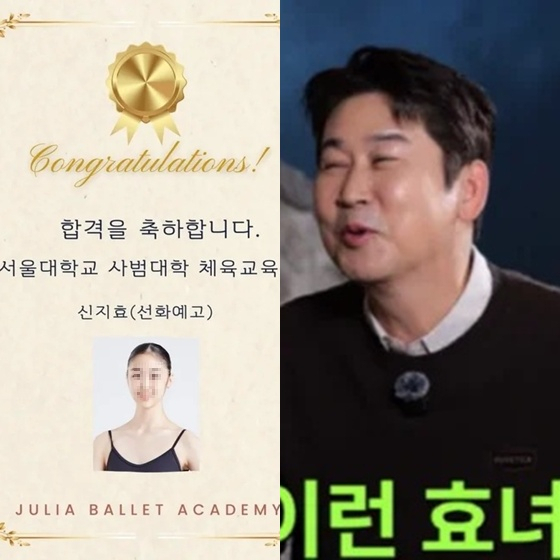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