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째 주 일요일은 스위스의 아펜첼인너로데주(州))와 글라루스주, 두 곳에서 1년에 한 번 정치축제인 '란쯔게마인데'(주민총회)가 열린다. 이 란쯔게마인데가 국내에 알려진 건 어림잡아 2010년쯤이다. 이후 국내서도 심심찮게 란쯔게마인데식의 직접민주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공무원 대상 참여예산 제안사업이나 수원시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 문제를 찬반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아펜첼인너로데주의 주도(州都)인 아펜첼의 인구는 5천여 명이고 주 인구라 해봤자 1만5천 명이 고작이다. 스위스에선 가장 작은 주이다. 실제 란쯔게마인데가 열리는 광장을 찾아가면 축구 운동장만 한 광장에는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와 벤치가 전부다. 광장 어디에도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없이 세계적인 정치 현장이라는 명성에 비해 평소엔 한적한 공간일 뿐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거수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이 외에도 스위스 유권자들은 현안마다 1년에 평균 24번 직접투표를 한다. '마을 주택의 외벽은 어떤 색으로 할까' '노동자의 유급휴가를 4주에서 6주로' '상점의 폐점 시간은 6시에서 7시로'라는 자잘한 문제부터 크게는 '올림픽을 개최할까 말까'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에만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다. 유럽의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이런 시시콜콜한 소식을 듣는 건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밀려 몇 년에 한 번씩 정치적인 결정만 하는 소외된 주인으로 전락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민주집중제적인 직접민주제도가 있었다. 해방 정국에서 중앙정부가 없는 가운데 '면 위원회'에서 지방의 정치, 치안과 행정을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안정화했던 역사가 있다.
'면 위원회'나 '란쯔게마인데'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3+1'이 필요하다. 충분한 공간, 지역 주민들의 공공성에 대한 의지, 결과에 대한 존중 등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주민 리더십' 형성이다. 직접민주제가 언뜻 보면 권한과 권력의 평등으로 이해되고, 이론적으로 맞더라도 '직접민주제'의 성공은 '선의와 공공성이 우선되는 주민 리더십'을 전제로 한다. 몇몇 기득권자들이 사욕을 채우고자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왜곡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민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의 모든 현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안과 어떤 이해관계인지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상황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자기주장을 맘껏 펼치는 거리 시위도 좋지만, 토론문화를 곁들인 차분한 '정치축제'에서 나의 권력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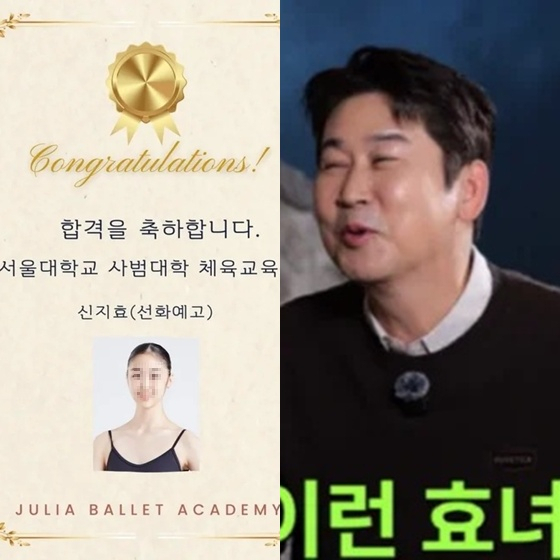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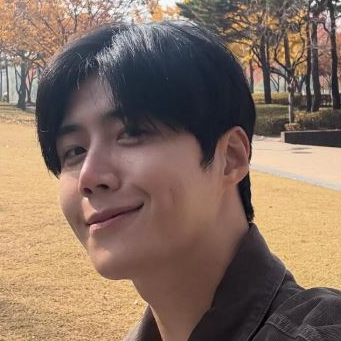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