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시태그: #부성애 #한국형서민히어로 #흙수저 #용산참사
*명대사: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이라구요.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능력인 사람들이라구요."
*줄거리: 치킨 하나로 대박을 터뜨려 청년 사업가로 우뚝 선 루미(심은경)는 가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가 된다. 망연자실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웃 가게 주인들과 힘을 합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세력들과 맞선다. 그러던 중 오래전 자신을 버린 아빠 석헌(류승룡)을 찾게 된다. 때마침 그는 염력을 가지게 되었고 늦었지만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 철거 세력에 맞서 싸운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에서 화염이 피어올랐다.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른바 '용산 참사'. 특공대의 강제 진압 속에 철거민 연합 회원 3명, 철거민 2명, 경찰 1명이 목숨을 잃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대참사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묻지 않고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과 용역업체 직원 7명만 기소했다. 현재 용산4구역에는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연상호 감독의 전작 '서울역'에는 '꿈의 신도시 용산 아파트 분양 시작!'이라는 광고판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다. 모델하우스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소녀와 돌아갈 집이 없다는 노숙자들의 욕망의 상징인 것. 그때부터 연상호 감독은 한국의 재개발사,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에 주목해온 것 같다. 뉴스로만 접해온 대한민국 사회의 이면. 영화 속에서 가상의 도시로 탈바꿈되었지만, 연상호 감독은 그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치킨집 사장 루미(심은경)는 방송사도 주목하는 '청년천왕'이다. 그녀의 매운맛 치킨을 맛보기 위해 손님들은 줄 서는 노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활기찼던 루미의 식당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용역 깡패들의 폭력에 의해 산산조각 난다. 이 과정에서 루미는 엄마까지 잃게 된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루미와 주민들은 결사항전에 나선다. 한편 아내의 부음을 듣고 10여 년 만에 딸과 마주한 은행 경비원 신석헌(류승룡)은 약수를 먹은 뒤 우연히 얻게 된 염력(초능력으로 물체에 손을 대지 않고 옮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 석헌은 때마침 얻은 염력을 무기로 루미와 주민들 편에 서서 냉혈한 홍 상무 (정유미)와 용역 깡패 일당에 맞서 싸운다. 고개 숙인 아빠가 비로소 '아빠 노릇'을 해보게 된 것이다.
연상호 감독 하면 '부산행'. 2016년 누적 관객 수 약 1천156만 명을 기록하며 연상호 감독을 천만 감독의 반열에 올린 초대박 흥행작이다. 성공 요인은 단연 좀비 소재 덕분이었다. 한국 영화에서 제대로 다뤄져 본 바 없었던 좀비물로 한국인에게는 친숙하고 현실적인 공간인 KTX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박'했던 영화다. 이 때문에 한동안 관객들은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서울역과 동대구역을 찾을 때마다 우르르 쫓아오던 좀비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액션과 좀비는 연상호 감독의 주특기가 아니다. 그의 장기는 권력의 이면 속 인간 군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을 돼지와 개에 비유한 '돼지의 왕', 종교의 진실을 파헤치는 '사이비'가 그러했다. 그런 면에서 '염력'은 연상호 코드의 집약체다. '부산행'처럼 부성애를 외피로 쓰고 있지만 메시지는 묵직해졌다. 반면 '부산행'에서 이른 바 '공유 신파'로 부담스러웠다면 이번에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신파 코드의 온도는 확연히 낮춰졌고 코믹 지수는 여유 만만하게 높아졌다.
연상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너무 쥐어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일축했다. 이는 중간 모니터 과정에서 모니터 요원들의 신파에 대한 반발로 약화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연상호 감독 내면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전작들이 거침없이 파멸로 달려가는 데 반해 '염력'은 소소한 행복으로 마무리된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사소한 가족의 일상이 감동적이란 걸 깨달았다'는 연상호 감독 신상의 변화가 작품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염력'은 유난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다. 호불호의 쟁점은 뻔한 개과천선의 공식을 따라간 부성애 코드와 용산 참사를 담은 문제의식이 얕았다는 점. 석헌의 초능력은 안간힘을 쓰는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와 서양 히어로물의 허를 찌르는 엉뚱한 때와 장소에서 발휘됨으로써 실소를 낳는다. 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진지해지는 영화 톤에서 석헌의 초능력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닌다. 이 과정에서 어설픈 아저씨의 몸 개그를 재미있게 보는 관객은 흥미를 느끼고, 완성도 떨어지는 CG에 터무니없는 초능력이라 느끼는 관객은 영화에 몰입할 수 없게 된다. 소시민의 억울함이 부성애 코드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클리셰는 어쩌면 불가피할 테다. 이에 연상호 감독이 던진 솔루션은 바로 블랙 코미디. 배우의 뜬금없는 코믹 액션과 어불성설 대사로 예상 가능한 플롯을 뒤집는 것이다. 블랙 코미디 장르는 진짜 웃기기만 한다면 웬만한 스토리의 구멍쯤은 쉽게 용서되는 힘을 발휘한다. 에디슨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전파상 주인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대한민국의 평범한 경비원 아저씨가 초능력자라는 설정부터가 블랙 코미디다. 이토록 수많은 잽을 보여줬음에도 '염력'에 핵심을 폭파시키는 한 방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다만 '공유 신파'를 남긴 '부산행'보다는 '염력'의 블랙 판타지가 더 연상호스러운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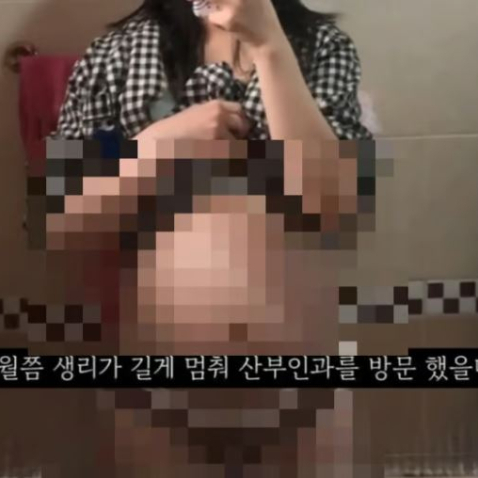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