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밥그릇마저 뺏으려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울진은 원전도 돈도 아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다. 장 의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울진에서도 대표적인 반원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신한울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갑상선암에 걸린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그이기에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장 의장의 말에서 지금의 탈원전 사태를 바라보는 울진 군민들의 평론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울진 군민에게 원전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짐 덩어리'이다. 이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사양화돼야 할 사업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울진을 포함해 원전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빠져 있다.
울진에 원전 건립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80년 군부 정권 시절. 이후 1988년 9월 한울원전 1호기가 건립되고, 2005년 6호기까지 우후죽순처럼 원전이 늘어섰다.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국내 원전 초기에는 국가 정책에 감히 일개 국민이 토를 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당연히 피해 보상이 없었고, 탈핵 논리는 국가반역죄처럼 다뤄졌다. 원전 건립을 앞두고 지역민들과 국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2010년쯤으로 봐야 한다. 기존 6기에 더해 추가로 4기를 짓기로 한, 신한울원전 건립 계획이 발표된 시기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년이나 흐르고, 지역민들의 선택은 공존이 전부였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울진의 산업구조는 원전 의존도가 상당해 원전의 직접적인 비용으로만 3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적 영향까지 합하면 최소 60% 이상은 원전산업에서 파생하는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공존인 셈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탈원전은 생활 터전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
금강소나무와 온천을 비롯해 대게, 송이 등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전 보유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 교통, 특산물 홍보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지을 때도 그렇지만, 철수할 때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에 군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울진에서도 신규 원전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위험시설의 추가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갑작스러운 탈원전으로 인해 지역이 떠안게 될 피해를 우려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다행히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참여해 청와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민이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를 구성키로 협의해 지역에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협의체의 직접 참여를 거부하고, 단순히 컨트롤타워의 역할만을 자처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스스로의 책임을 버리고 단순히 시간끌기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아무쪼록 청와대가 지역에서 더 이상 불안과 불만의 덩어리가 커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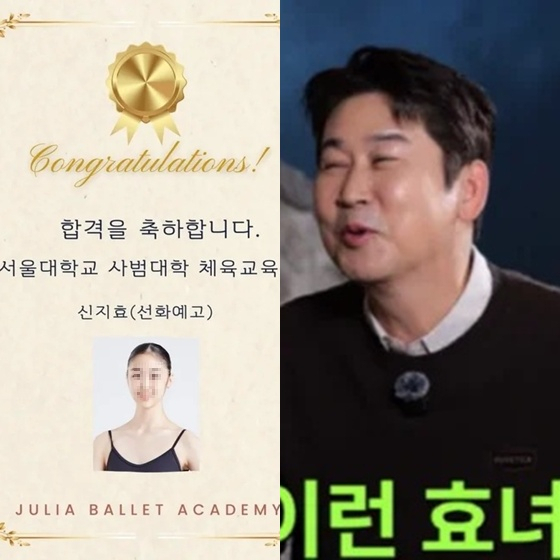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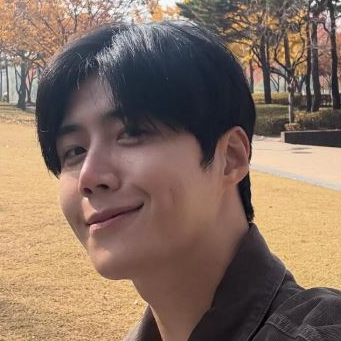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