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한국당' 창당 아이디어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정치에 프랜차이즈 정당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한국당'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을 키워 분가(分家) 시킨 후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전혀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구 기호(한국당)와 비례대표 기호(비례한국당)를 모두 '2번'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표결처리 강행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여당과 여타 야당들은 '국민기만'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적지 않겠지만 핵심지지층이 결집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수 감소를 벌충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의 시도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집착한 일부 정당들이 정략적으로 제도도입을 밀어붙이다보니 반대진영의 대응도 '꼼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 내 의석분포를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에 최우선 연동해 배분한다. 예를 들면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라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전체 국회의원 정원의 30%가 되면 비례대표를 전혀(연동률 100%) 배정받지 못하는 식이다.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각 정당의 정당득표비율을 대입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많은 정당도 정당득표율에 준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포항북)은 "최근 당원들로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정당득표율에 준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33%과 7.3%의 정당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던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17석과 4석에서 3석과 11석으로 변한다는데 이는 명백하게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의 핵심은 정당득표율이 의회 의석배분을 위한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충분하냐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로 정당정치가 고도화된 국가에서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정치인을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성향이 강하고 아직까지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에 적용해도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뿌리 내린 이념정당 없이 대권주자와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정당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정당득표율이 의석배분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구도가 되기 쉬운데 한국형 대통령제와 궁합이 잘 맞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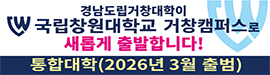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