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쇠퇴와 더불어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이 같은 '미스 매칭'의 해결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 소멸 고위험 지역 10곳 가운데 6곳이 경북 지역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불러온 심각한 도시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틈으로 '지방소멸'이란 암초가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도시쇠퇴 문제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원도심 살리기' 이른바 도시재생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즉,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아예 핵심 국정 과제로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둘 정도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쇠퇴해 가는 일선 시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도시재생을 통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뉴딜 정책으로 사업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북도는 2014년 영주와 2016년 김천, 안동 등 3개 지역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 2017년 영천역 등 도내 6곳과 포항지진의 진원지인 흥해읍을 특별도시재생사업지구로 관철시켰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일반 지역 60%에서 80%까지 상향시켰다.
2018년에는 포항 송도동 항만 재개발 연계 사업을 포함한 9곳이 선정되었고, 지난해는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를 포함한 10곳이 선정되는 등 경북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메카'로 떠올랐다.
이로써 경북의 도시재생사업지구는 2020년 11월 현재 21개 시군 40여 곳으로 연관 사업을 제외한 순수 도시재생사업비만 8천억원을 돌파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까지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구상을 도시재생과 접목시키기란 쉽지 않은 과제임은 틀림없다. 철저한 준비로 국비와 기금, 융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 넘치고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스마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도시재생에도 충분히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색깔을 입힐 수 있다.
첨단기술이 장착된 인공지능 CCTV, 주차공유, 스마트주차 통합관제, 의료서비스, 대중교통 정보 체계 등이 바로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대량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여기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딥러닝으로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북도가 추구하는 경북형 스마트시티다.
만화의 도시 경기 부천에서는 행복주택 사업과 결합해 국내 첫 '문화예술인 주택'과 함께 '웹툰 융합센터'를 짓고 있다. 전주와 밀양에서는 무형문화 전승에 특화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사회적 재생, 경제적 부활로 진화해 간다. 우리 도에서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제도와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웅도 경북의 면모를 보여줄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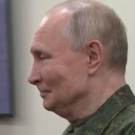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