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만큼 기다림이 힘들고 절실한 때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가수 진성이 부른 '안동역'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바람에 날려 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지금 우리는 기다리다 못해 지쳐 있다.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지 않는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괴물과 싸워 온 지 1년이 넘었다. 기다림은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지만 그간의 기다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리는 단지 마스크를 벗고, 친구와 얼굴을 마주 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눌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삶의 길이 막막한 분들의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듯이 우리의 간절함이 분명히 그날을 앞당길 것이다.
기다림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뮈엘 베케트다. 그는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이란 '화두'를 던졌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고도'를 기다리는 책이다.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도대체 '고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 두 주인공이 왜 '고도'를 그렇게 무심하게 기다리는지,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베케트는 '희망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행동이 기다림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고도'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Godot)이 그들을 찾아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침 지금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대림절'이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지키는 절기로 '대강절' '강림절'로도 불린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Advent'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왔고, 그 뜻은 '오다'(coming), '도래하다'(arrival)란 뜻이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미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종교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기독교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도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적 기다림도 아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야 할 미래가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왜 그런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누구를 기다리겠는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1945년 4월 9일 처형당할 때, 그는 나치 수용소에 함께 갇혀 있던 수용자들과 이렇게 작별했다고 한다. "이제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지금이 어떻든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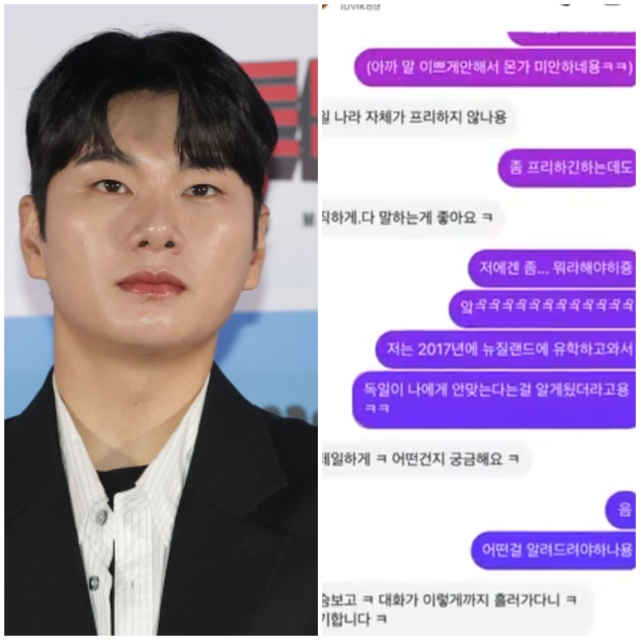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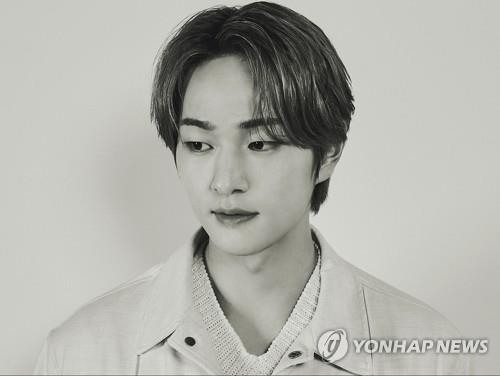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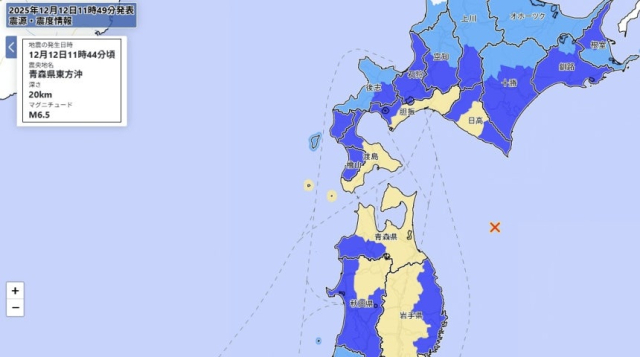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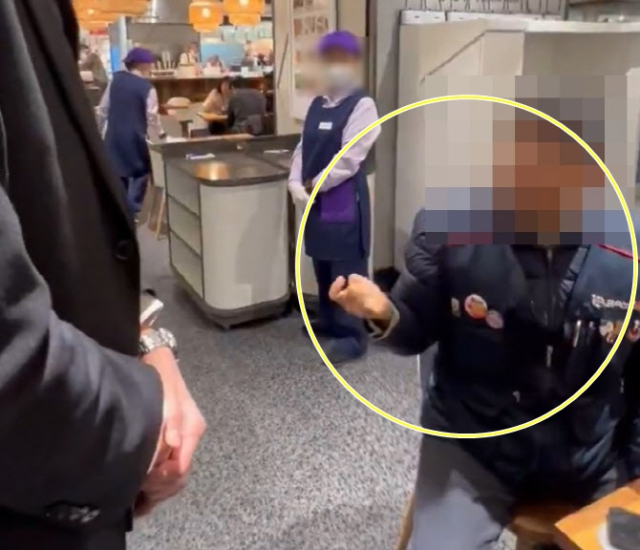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