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중반이후 우리 시단에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해온 깨달음의 시, 소위선시풍의 시창작경향이 상당한 문학적 성과에도 불구, 현실밖으로의 도피나초월 혹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부자유의 냄새가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신정현교수(서울대 영문학)는 계간{문예중앙}가을호에 발표한 평론 {산비둘기의 꿈 그리고 수도승의 해탈}에서 김지하씨의 {애린}(86년)과 {별밭을 우러르며}(89년) 이성복씨의 {남해금산}(86년) 황지우씨의 {게 눈속의 연꽃}(90년)조정권씨의 {하늘이불}(90년) 고은씨의 {내 조국의 별 아래}(91년) 최승호씨의 {고해문서}(91년)등 선시풍의 시로 자리매김할 수있는 상당수의 작품들에서 역사로부터 계시를 찾거나, 끊임없는 자기부정으로 속세적 욕망을 정화하거나, 우주와 합일된 자아의 희열을 경험하는 시인의 모습을 읽고있다.그러나 신교수는 이들 시인들이 이같은 깨달음의 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역사의 계시를 올바르게 읽었는지, 현실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하는 문학의 힘을 보여주었는지, 자기부정과 자기정화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고은 김지하 이성복씨의 선시풍의 시들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지적 초월에 도달한 시로 돋보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는 하지만 이들의 시에서조차 [현실은 날것으로 그대로있고, 욕망의 자기정화는 투명하지 못하며 깨달음과 초월은 갑작스럽다]고 지적했다.
[각질화된 현실의 껍질을 깨고 이름없이는 우리의식속으로 들어올 수없는현실의 알맹이에 새로운 언어의 집을 지어주는 일]이라는게 신교수의 시인에있어서 {초월}의 정의.
최승호씨의 {고해문서}에서 초월의 움직임을 읽을 수있지만 시인이 생각해낸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름은 시적 기교의 미숙함으로, 한편으로는 현실인식의결핍으로 나타난다는 것.
서정주씨의 {한 솥에 밥을 먹고}에서도 새로운 현실이 없으므로 초월도 없고시인은 오직 체념의 노래속에 익사해 현실을 잊을 뿐이라고 말하고 김지하씨의 {애린}에 나오는 시들은 아주 단순한 선시의 원형적 구조를 갖고 있을뿐어두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름은 없고 수동적이며 피동적인 초월을 꿈꾸고 있으며 황지우씨의 {게 눈속의 연꽃}에서 우리는 초월의 길을 찾아 방황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초월지향의 농축된 정서만 가득할 뿐이라고신교수는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선시풍의 창작경향에서 무엇보다 초월주의 시인들이 극복해야할것은 [진공속의 비상을 꿈꾸는 산비둘기같은 낭만주의자의 허황한 꿈과 욕망의 거세를 꿈꾸는 수도승의 초라한 꿈, 자기 이외의 모든 세계가 자신을 위해서 변화해 주기를 바라는 혁명가의 화려한 꿈]이라고 신교수는 결론짓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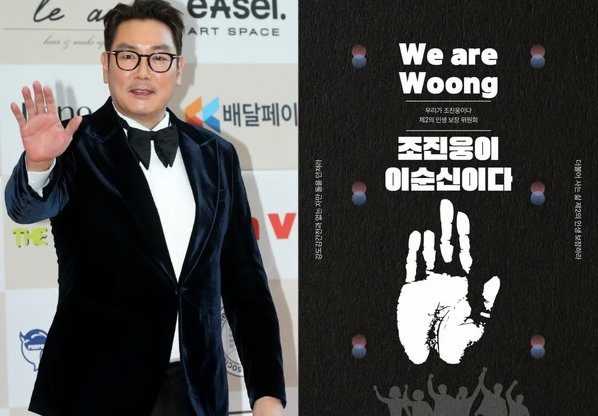
![[단독]](https://www.imaeil.com/photos/2025/12/09/2025120916495497381_l.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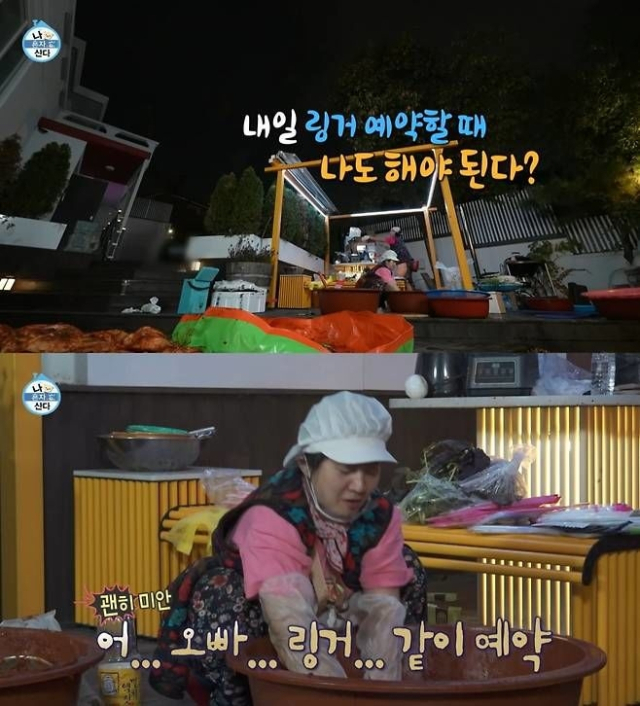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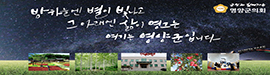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통일교 측 "전재수에게 4천만원·명품시계 2개 줘"…전재수 "사실 아냐"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사상 첫 '의원 입틀막'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주호영 "'당심 70% 상향' 경선룰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