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목소리를 낮춰요
주부 이경자(43.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는 지난 달 송현네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갑자기 끼여 든 차에 오른쪽 문짝이 심하게 찍혔다. 자신이 피해자였지만, 각자 차를 수리하기로 하고 사고 현장을 서둘러 빠져 나왔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워낙 큰 소리로 험악하게 달려드는 통에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26만원이나 생돈을 들여 문짝을 교체했다.
대구 사람들은 말투가 시끄럽기로 소문이 나 있다. "싸우는지 얘기하는지 구별이 안될 정도"란 것이 외지인들의 평.
이달 초 비즈니스관계로 대구시내 한 음식점을 찾은 사업가 김영구(46)씨. 기분도 풀고 사업 얘기도 할 겸 친구와 만났다. 5, 6명의 젊은 남녀들이 옆좌석에 앉은 것은 그들이 사업 얘기로 막 넘어가려고 하던 순간이었다.
워낙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길래 몇 차례 눈길을 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무안해 할까봐 "목소리가 호방하군요"라고 재치있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큰소리로 떠드는 바람에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지금도 김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젊은이들이 큰 소리로 웃고 얘기하는 것이 무척 가식적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자신의 호탕함을 과시라도 하듯이 일부러 크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당한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몇 사람의 단순한 자기 과시 때문이었다는 것에 김씨는 더 기분나빠했다.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연극인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 앞자리 관객의 얘기소리가 커 대사를 잊어버리는 일도 잦다고 실토했다. "소곤거리는 소리도 마치 탱크소리 같이 크게 하는 것이 대구사람"이라고 했다.
말소리의 높이가 그 사회의 민도와 비례한다는 말도 있다. 독일 카셀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 이규인(41)씨는 "독일에서 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뿐"이라며 "말하고 웃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 소양"이라고 말했다.
김중기기자 filmtong@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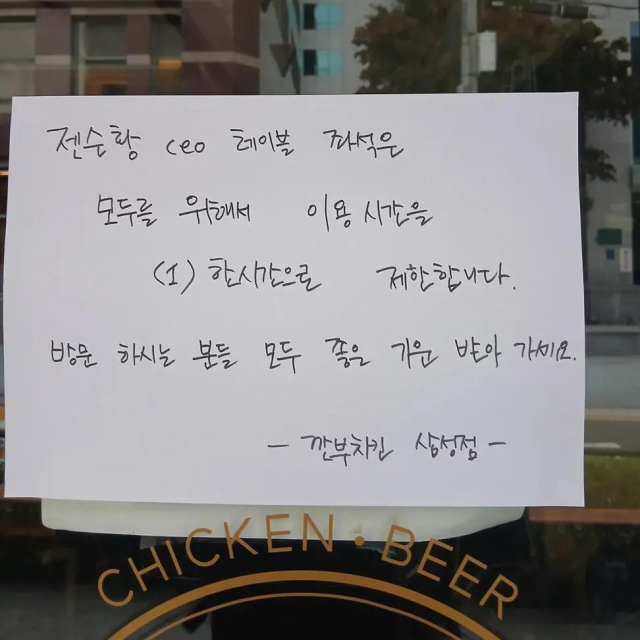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