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허경호(22.대구대 초등특수교육3)씨는 세상 어디든 안내견 한올이와 동행한다. 화장실, 강의실, 식당, 극장은 물론이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택시를 탈 때도 한올이는 곁에 있다. 한올이의 출입이 금지된 유일한 장소는 대중 목욕탕. 허씨는 지난 7월 한올이를 만났다. 조금 빠른 듯한 한올이의 걸음에 불안했던 것도 잠시, 시각 장애인의 상징인 흰지팡이로 느리고 불안하게 걷던 시절에 비하면 신바람이 난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도 흰지팡이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알루미늄 지팡이가 무엇인지 모를 쇠붙이에 부딪혀 '쩌엉'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낼 때면 장애인들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만다. 게다가 어설픈 지팡이는 차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둔 대리석을 찾아 내지 못하기 일쑤. 무심코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리에 소리도 지르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멈추는 일도 흔하다.
"한올이를 만난 뒤로는 낯선 골목길도 불안하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지팡이와 꼭 같지만 한올이는 지팡이가 갖지 못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허씨는 한올이가 뿜어내는 생명의 힘이 어둠을 밝힌다고 말한다. 단순히 개가 지팡이보다 길을 더 잘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둠이 품기 마련인 설명하기 힘든 공포를 막아준다는 의미이다.
한올이는 허씨의 말을 꽤 많이 알아듣는다. 서너 번 가본 장소는 이름만 대면 거침없이 찾아간다. 이제 두 살, 어린 나이에도 얌전하다. 좀처럼 짖지 않는다. 버스나 강의실, 식당에서는 몸을 의자 밑에 숨길 줄 알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군침을 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안다. 걸을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 바싹 붙어 걸어야 함을 알고, 누군가 호기심에 장난을 걸어와도 대꾸해서는 안됨을 안다. 음악 소리 요란한 노래방에서도 얌전히 기다릴 줄 안다. 그래도 허경호씨와 한올이는 곳곳에서 푸대접을 받는다.
"몇몇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들이 탑승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 37마리뿐인 데다가 대구에는 6마리뿐이거든요". 한올이는 '삼성 안내견 학교' 출신이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굳이 양성비를 따지자면 8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허경호씨를 비롯한 전국 37명이 안내견을 기증받았다.
"시각 장애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불편하고 위험할뿐더러 사람들도 장애인을 꺼리거든요. 그렇지만 한올이를 만난 후로는 외출이 즐거워졌어요".한올이의 멋있는 모습에 반한 사람들은 종종 한번쯤 쓰다듬거나 만져보고 싶어한다. 허씨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심하게 쓰다듬거나 꼬리를 잡아당기면 한올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씨는 안내견의 외출은 '놀이'가 아니라 '임무수행'임을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캐나다 산 리트리버 종이며 지능지수 70정도인 한올이의 수명은 대략 18년, 안내견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간은 15년쯤 된다. 22세의 허경호씨는 15년 뒤에 찾아올 이별을 벌써 걱정하고 있었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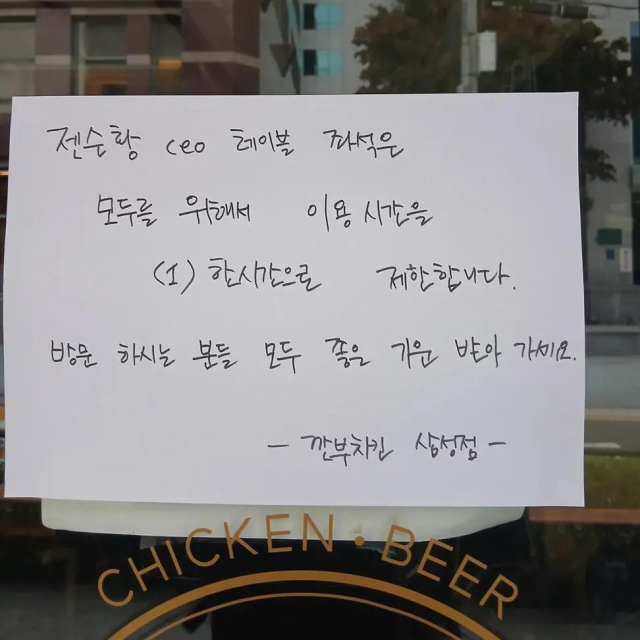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