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공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오면 우리는 저녁밥술을 놓기가 무섭게 불나방처럼 다투어 그리로 모여들었다. 농활을 나온, 갓 피어난 꽃송이같이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대학생 누나들, 그들은 아직 문명의 밝은 빛이 미치지 않고 있던 시골 아이들의 가슴에 먼 미지의 세계에의 동경이며 대처(大處)에의 화려한 꿈이며 낭만적 삶에의 설레임, 이런 소중한 것들의 영상을 깊이깊이 각인(刻印)켜 준 전도사들이었다.
누나들의 몸에서는 우리가 그 때까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싱그러운 체취가 풍겨났었던 것 같다. 풋풋한 사과 내음 같기도 하고따스한 자스민 향 같기도 한 향내가.우린 그때 그 누추하고도 비좁은 공회당에 햇병아리처럼 올망졸망 모여 앉아 지금은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노래들을 참 많이도 배웠었다. '오빠 생각'·'따오기' 이런 따위의 동요도 배우고, '과수원길'·'섬마을 선생님 같은 그 시절의 유행가도 배웠던 것 같다.
밤이 이슥해져 하루의 일과를 접어야 할 시각이 되면, 누나들은 언제나처럼 벽장 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공책이며 연필 그리고 크레용 같은 다른 학용품을 꺼내어 아이들의 까맣게 때묻은 손에 골고루 쥐어주곤 했다.그 따스한 손길, 그 속 깊은 마음씨가 꼭 동화 속의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 정서가 또한 그만큼 순수했던 까닭에서이리라. 그렇게 얼마간을 촌뜨기 아이들은 솜사탕처럼 부푼 행복감에 취했었다.
그리고 짧은 만남 뒤의 기약 없는 헤어짐, 누나들이 긴 눈맞춤 한 번을 남기고 아지랑이처럼 흐릿한 영상으로 흐물흐물 시야에서 멀어져가 버리던 날, 우리는 돌아서서 오래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난다.
가슴 그득 아쉬움이 고여 오는 어린 시절의 삽화이다. 생각해 보면 마치 한 자락의 환상 같기만 한 그 때가 오늘따라 몹시도 그립다.영사기의 필름같이 되감을 수만 있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그 애틋하도록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다. 피노키오처럼 선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보고 싶다.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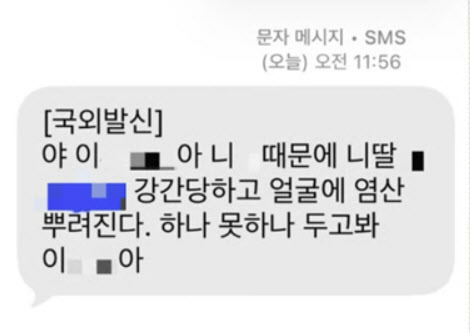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https://www.imaeil.com/photos/2026/02/05/2026020517375601025_l.jpg)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
배현진, 왜 윤리위 제소됐나 봤더니…"사당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