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 진흙소가 달빛을 밭간다
구름 속 나무말이 풍광(風光)을 고른다
위음(威音)의 옛곡조 허공 저 뼉다귀라
외로운 학(鶴)의 소리 하나 하늘 밖에 길게 간다.
소요태능(消遙太能·1562~1649) '종문곡'(宗門曲)
조선조 대선사의 잘 알려진 선시입니다. 선시는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논리(언어)나 관념(언어)을 넘어서면 시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흙소가 물 위에서 달빛을 밭갈고, 나무말이 구름 속에서 풍광을 고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논리를 버리고 이미지를 그대로 보면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령 진흙소(泥牛), 나무말(木馬), 위음(威音王) 등 불경에 나오는 얘기를 잘 몰라도 익숙한 관념의 벽을 깨뜨리면 그 너머 밝은 빛이 느껴집니다. 어린이의 상상력보다 어른들의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언어(논리)에 묶여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시는 언어가 끝나는 데에서 출발한다지 않습니까?
이진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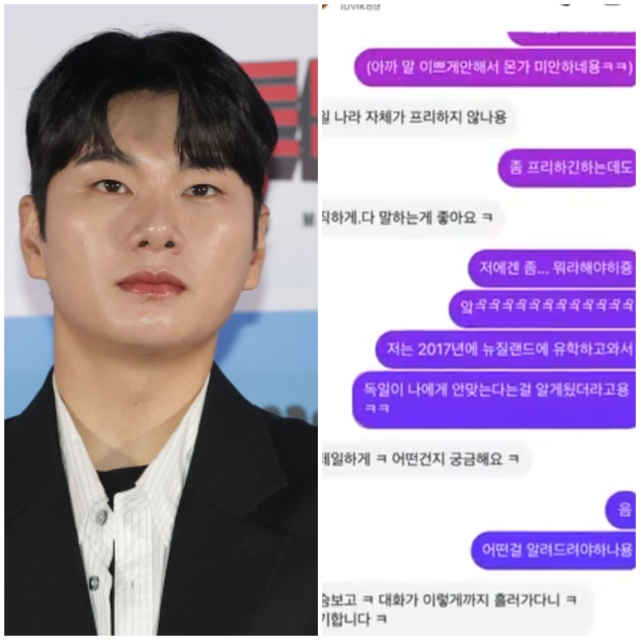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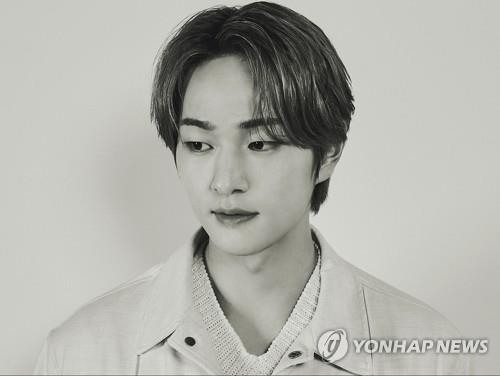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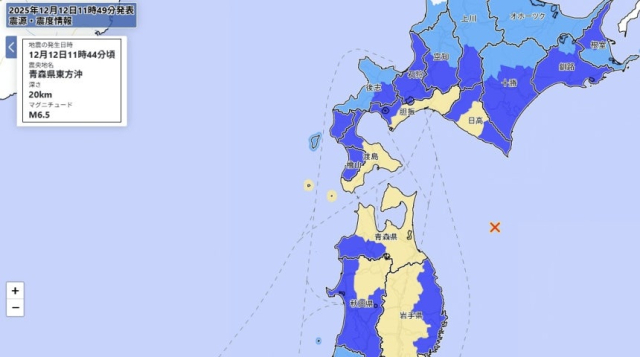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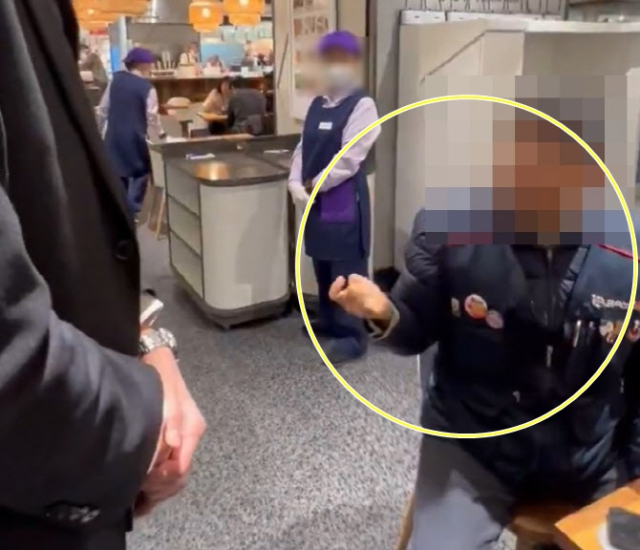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