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중천에 뜨겠다 어서 일어나 소 띠끼러 가거라' '학교 파하면 핑 와서 소깔 비어라이 길목에서 놀았다만 봐라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을 팅게'
김남주 시인의 시 '아버지'에 나오는 전남 해남지방의 방언 담화에는 당대 역사성의 물결무늬를 찾아낼 수 있다. 아버지의 당시 표정과 느낌, 정감과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방언을 사용한 담화의 기능과 효용성의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마 유치환의 시에 등장하는 '항가새꽃'은 엉겅퀴꽃이다. 엉겅퀴의 경남 충무지역 방언이 '황가새'인 것에서 알아냈다. 엉겅퀴꽃은 또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뽑아낸 못을 묻은 장소에서 피어난 성화(聖花)이기도 하다. 청마의 시 '깨우침'에 나오는 '저 먼 동방의 항가새꽃빛 새벽을 부르며'란 대목에서 '항가새꽃빛'이라는 시어가 느닷없이 나오는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시에서 어휘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예이다.
'달 아래 # 멋업시 섯든 그 여자', '삽분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김소월의 시어는 산 높고 골 깊은 평안도 방언을 기층으로 하고 있다. 때로는 사무침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우리 정서에 당겨놓은 소월의 시는 평안도 토박이의 가림없는 자연 언어의 물결무늬로 빚어낸 것들이다.
'버려진 문받이였는지 몰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보다'. 이육사의 시도 경상도 방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작품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상화의 시도 대구 방언을 모르고는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시어를 잘못된 표준어로 옮겨 본래의 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맛깔마저 왜곡시킨 오류들이 너무 많다.
경북대 국문과 이상규 교수가 출간한 '위반의 주술, 시와 방언'(경북대출판부 펴냄)은 다소 도발적인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표준어 중심 사회에서 시인들이 시에 방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준어가 아닌 방언 역시 소중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그래서 시에 나타나는 방언은 모국어를 더욱 견고하게 쌓아올리는 뒤주간에 든 우리들의 양식과도 같다고 한다.
"서울말이 중심이 되는 표준어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시인들의 작품 속에 서성거리고 있는 지역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난해한 시어를 쉽게 풀어 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 교수는 농경시대의 문화유산인 방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으로 묻어 두었던 우리 민족의 결 고운 언어유산들도 문화유산이란 측면에서 수집·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향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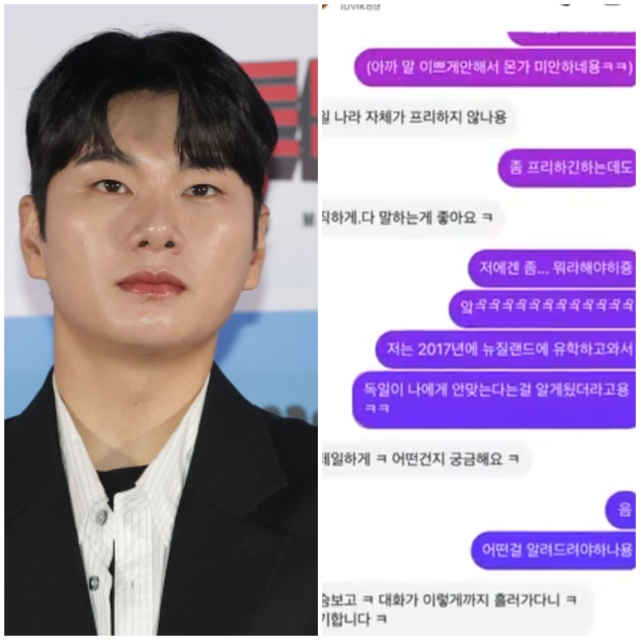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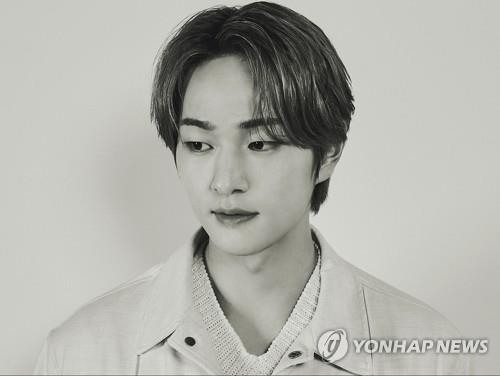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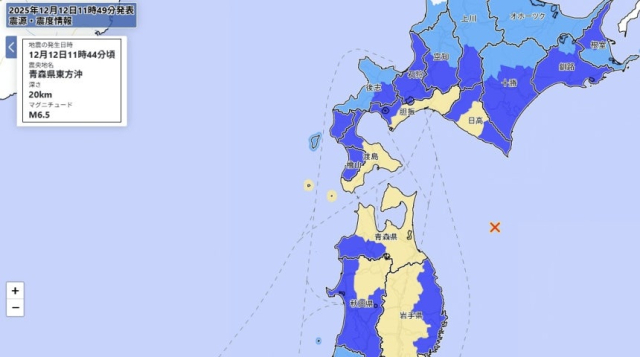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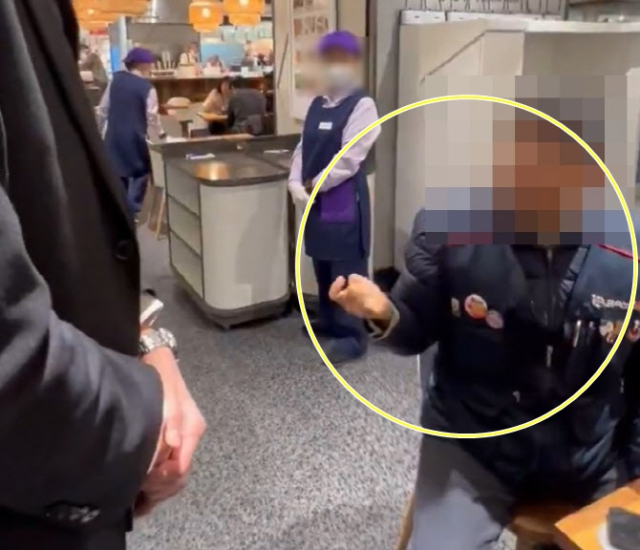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