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고 있지만 하나의 작품전과 무대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문화예술계의 숨어있는 뒷이야기들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전시회가 열릴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들까? 고가의 미술품이면 보험료도 만만찮을터. 내달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문화사 60년 대구전' '광복60주년 기획전' 등에 이쾌대의 '군상(1940년대작)' '자화상(1940년대작)' '무희의 휴식(1938년작)'과 이인성의 '해당화(1944년작.사진)' '항구에서(1945년작)' 등 고가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보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8월 11일부터 해방 이후 작품 총 110여점을 전시하는 시안미술관은 이중 절반 이상의 작품에 대해 개별 미술작품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 규모는 총 예산 2억1천만원 중 10%인 2천만원 가량. 그런데 개인 소장가가 유명작가의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보험료 공개를 꺼리는게 현실. 보험평가액이 판매금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쉬쉬하며 보험평가액 미공개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내 미술시장의 미술품 보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현대해상 미술품 보험담당 설계사인 구교한씨는 국내 미술시장의 보험시장규모를 약 20억원대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전시회가 늘어나면서 보험시장도 커지고 있는 추세. 실제 지난해 열린 '서양미술 400년사'나 '샤갈전' 등의 대규모 전시는 보험평가액만 1천억원대를 훌쩍 넘어, 주최측이 지불해야 했던 보험료만 해도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수가가 높은 까닭에 보험평가액이 높은 주요 작품은 빼고 전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작품가가 수천만, 수억원대를 호가하지 않는 이상 보험료 지불이 여의치 않기 때문. 화랑이 초대전을 열어도 보험을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사설경비업체에 추가경비를 지불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 초대전은 주최측이 작품보험을 책임지지만 작가들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보험에 들면 작품 판매 여부가 금방 드러나, 그 나라에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눈속임을 위해 멀쩡한 작품을 갖고 나갔다가 돌아올 땐 판매한 작품 대신 빈 캔버스를 갖고 돌아오는 웃지못할 사례도 있다.
한편 현재 미술작품 보험은 국내 11개 보험회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미술 보험시장 규모가 적어 대부분 외국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들어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있다. 최세정기자 beacon@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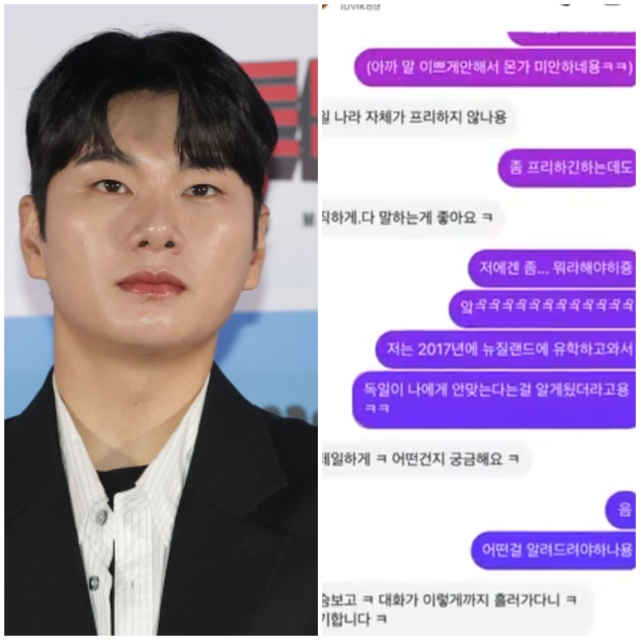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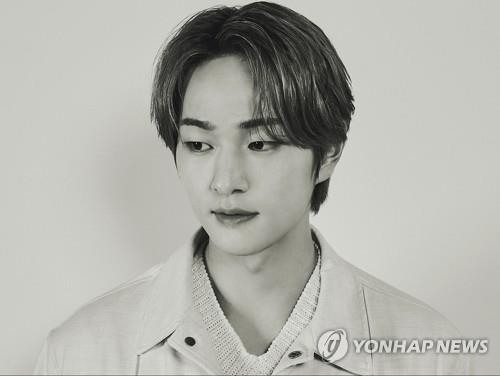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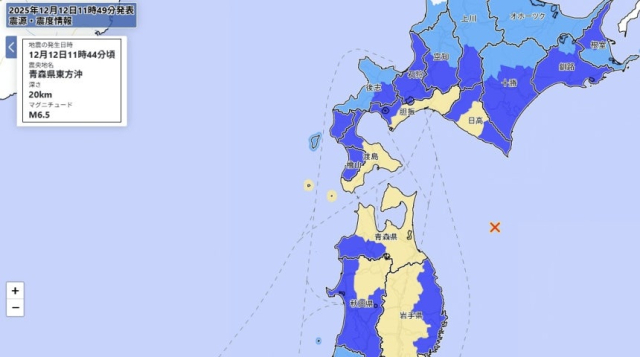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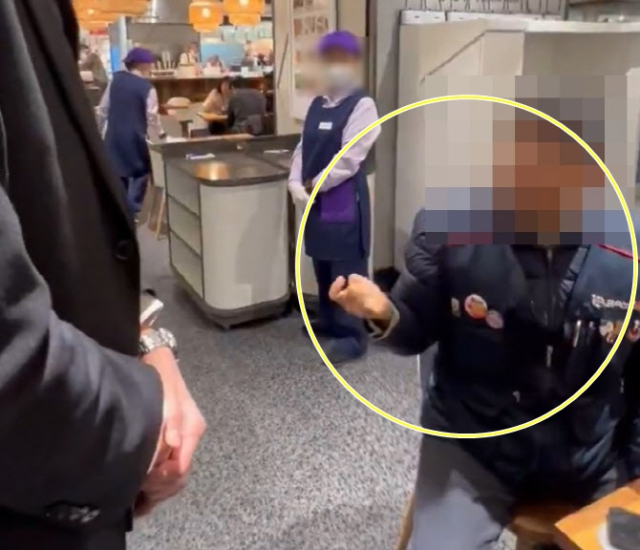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