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효숙 憲裁(헌재) 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임기 도중에 사퇴하고 새로 소장 지명을 받은 것은 헌법 違背(위배)라고 지적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만큼 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의 전 후보자에게 청문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법 최고기관의 首長(수장)에 대한 청문회가 임명 절차상의 적법성 논란으로 파행을 겪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소장 임기 6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재판관 중도 사퇴' 방법을 동원한 대통령한테 근본적 원인이 있다. 그냥 전 후보자가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헌재 소장으로 옮겨 남은 임기 3년만 재직하도록 했으면 자연스러웠을 인사였다. 그걸 무리하게 임기 늘려 주기 便法(편법)을 쓰다 보니 '코드 인사' 논란에 이어 후보 자격 시비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전 후보자 또한 自招(자초)한 측면이 있다. 임기 문제를 거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고 재판관을 사퇴했다는 것은,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헌재 소장의 자세에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中立性(중립성)이 생명인 자리가 자칫 대통령과의 종속적 관계로 비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판결'이 많다는 의심을 사고 있지 않은가. 전 후보자가 "(자신의) 남은 임기 3년이면 헌재의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또한 선뜻 納得(납득)이 안 간다. 9명 헌재 재판관 중의 한 명이기도 한 소장이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고 그런 논리를 펴는지 알 수 없다.
국민적 信望(신망)이 절대적인 헌재 소장의 권위가 출발부터 얼룩지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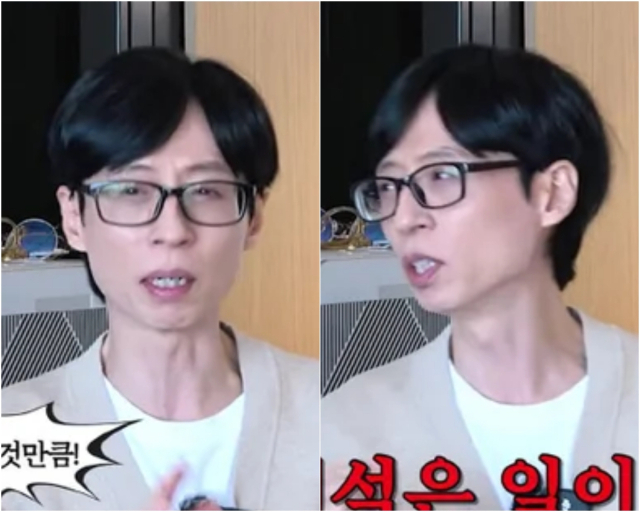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