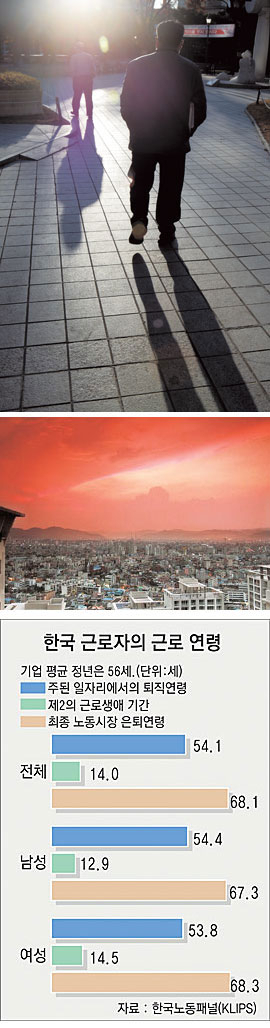
대구사람은 너무 일찍 늙어버린다? 어디 대구 뿐이랴만은 대구의 조로현상은 유독 심하다. 40대만 되면 '한 분야의 대가'가 되어버리고 50대는 '원로'를 자처한다. 한창 현장에서 뛰어야 할 나이에 이미 늙어버린 것이다. 짐짓 재껴야 전문인 티가 나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성공한 사람이되는 대구의 분위기가 조로현상에 한 몫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고 한다. 지역 모대학 교수는 마흔 살에 해외 유학을 다녀와 교수가 됐고, 유명 주류업체 회장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창업했다.
성취감과 자기계발을 모른 채 자리와 연봉에 연연하는 당신, 이미 마음의 나이는 늙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라도 젊음의 역동성을 되찾아 보자.
젊고 생생한 활력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좋은 '무기'로 평가받는 시대. 한 살이라도 젊게 보이려는 중년들의 갖은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젊어지지 못해 안달 난 사람들이 왜 사회적으로는 너무 일찍 '원로'를 자처하고 발전따위와는 담을 쌓고 사는걸까? 나이에 비해 빨리 늙는 것을 일컫는 말인 조로(早老)현상. 우리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보다 한 템포 앞서 뒷짐지고 뒷방 늙은이 노릇을 자처하는 '조로'해버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창 업적을 쌓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흠흠~" 헛기침이나 해 가며 일은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은 느긋하게 자리나 보전하려는 것이다.
# 조로의 흔적들
보수성과 폐쇄성에 있어서는 둘째라면 서러워할(!) 대구지역은 유독 이런 조로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직급과 권위에 연연하는 사회분위기 탓에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다 싶으면 그것을 유지하는데만 급급할 뿐이다.
외과 의사들은 40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창 수술에 물이 오를 때"라고. 하지만 모 종합병원의 과장인 A(45)씨에게는 거리가 먼 말이다. 1년 전 과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는 아예 수술에 흥미를 잃었다. 간혹 야간 응급 수술 전화가 오면 화부터 치민다. "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꼭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병원에 나와야 하는겐가?" 아랫사람들에게 호통치기 일쑤다. 한 개업의는 "서울 같으면 한창 열심히 수술하고 실력을 쌓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구지역에서는 유독 '높은 사람 행세'에나 신경 쓸 뿐 현장의 일 따위에는 관심을 잃어버리는 중년 의사들이 많아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다. 상대적으로 워낙 간부급이 많은 회사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부장직급의 현장 배치를 검토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 그는 "40대 초·중반의 직장인들 마저도 '내가 이 나이에 현장을 뛰어야겠냐'며 언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대구사회"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렇다고 대구가 다른 도시들보다 일찍 늙어버릴 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회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워낙에 나이 많은 원로들이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실. 그러면 왜 대구는 상대적으로 활동성과 역동성이 떨어지는 침체된 도시가 되고 말았을까?
이에 대해 한 문화계 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원로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젊은 사람들을 발탁해 키워주는 시스템이 자리잡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40, 50대의 연령층 마저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며 "인의 장벽으로 둘러싸고 발전을 포기한 채 스스로 굴을 파고 들어가 누워버리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 공무원 마저도
일부 사람들은 이런 조로 현상에 대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낸 병폐"라고 지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런 조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B(48)씨는 얼마 전 자신보다 3살 연하의 상사를 맞았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상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걸핏하면 반말을 하곤 한다. 스스로 '진급에는 관심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B씨, 그는 이미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몸담고 있다보니 스스로 '원로'임을 자임하면서 자신보다 나이어린 상사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진급을 포기한 6급 공무원, 교감 승진을 포기한 만년 평교사를 일컫는 소위 '교포조'는 높은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집단이 돼 버렸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연륜과 인맥을 바탕으로 실력과는 무관한 막강한 마이너리티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다 얼마전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한 인사는 "공무원 사회의 견고한 시스템이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 속에 안주할 수 밖에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해도 갑갑함을 느낀다는 그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의에 질려 같이 일을 하기 힘들다는 푸념을 많이 했지만, 이것도 함께 생활을 하다보니 어느정도 이해할 수 밖에 없게됐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가 일찍 젊은 혈기를 잃어버리고 '될데로 되라'는 식의 늪에 빠져드는 이유를 직급·연령순으로 체계화 된 조직 질서와 의회·감사원 등의 감사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잘하려는 의욕에 한껏 불타던 사람이라도 세부 법규 하나때문에 뜻이 좌절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해 만의 하나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신상필벌 위주의 분위기에 억압되다보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리보전이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로현상'이지요."
#학교에서도
노익장을 과시하는 학자를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50대 후반만 들어서도 새로운 연구를 접고 원로교수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아예 일부 교수들은 자리욕심에 눈이 멀어 강의며 학술연구는 딴전으로 밀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가 냅네~'하며 정년이 보장된 교수의 권력을 무한히 즐기는 것이다. 40대 초반의 한 교수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보니 부지런히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들은 연구 성과 발표에도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한숨지었다.
금융계에서는 아예 정년퇴직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능력이 탁월하면 이미 젊은 나이에 임원급으로 발탁되고, 아닌 경우라면 채 10년을 넘기기 힘든 것이 금융업계다. 하모(37)씨는 "금융계에서 '정년'이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며 "증권·선물·옵션 등의 거래에 있어 기본을 익히는데만 몇 년이 소요되고, 노하우를 발휘하려면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지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감각이 있다고만 믿어버리는 것이 이쪽 바닥"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0대를 넘기면 아예 의욕상실 정도가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져든 금융업계의 현실이다. 하 씨는 "얼마 안있으면 잘릴 것이 뻔한데 임원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바에야 죽어라고 일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냐"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사진'정재호 편집위원 newj@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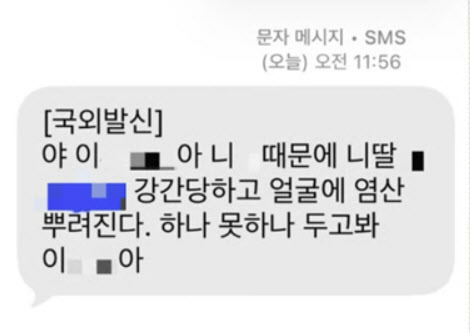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https://www.imaeil.com/photos/2026/02/05/2026020517375601025_l.jpg)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
배현진, 왜 윤리위 제소됐나 봤더니…"사당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