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월은 오수를 물리치기가 겨운 계절이다. 점심을 끝내고 나니 봄기운에 취한 고양이처럼 눈꺼풀이 무거워 온다. 식곤증도 떨쳐버릴 겸 해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슬슬 산책을 나선다. 근무처가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톨릭 대구대교구청과 마주하고 있는 덕분이다. 설렁설렁 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히기에 참 안성맞춤인 곳이다.
아름드리 갈참나무와 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들이 어느새 짙은 그늘로 터널을 만들어 놓았다.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니 한결 기운이 솟는 느낌이다. 팍팍한 일과 중에 잠시 짬을 내어 갖게 되는 오아시스 같은 즐거움,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호사할 수 있음은 작은 축복이 아니다.
이리저리 거닐다 보니, 오늘도 습관처럼 성직자 묘역으로 발길이 닿았다. 묘역 입구의 붉은 벽돌담에 라틴어로 씌어진 글귀 하나가 묘한 여운을 끌면서 옷깃을 여미게 만든다.
'HODIE MIHI CRAS TIBI.'(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먼저, 줄지어 늘어선 사제들의 무덤 앞에 서서 매무새를 고치고 경배를 올린다. 내 비록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먼저 가신 분들에게 예를 갖춤은 산 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런 다음, 소리나지 않게 까치발로 옮겨 다니며 묘비에 새겨진 한 분 한 분의 생몰 연대를 찬찬히 더듬어 내려간다. 더러는 고종명을 한 경우도 보이고, 더러는 꽃다운 나이에 꺾이고 만 경우도 눈에 뜨인다. 그 생존 기간의 차이가 유원한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전에 거쳐 갔을 누군가의 발자취를 지금 내가 따르고 있듯이, 오늘은 내가 여기를 둘러보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리라.
이 묘역 앞에 설 때면 나는 늘 '순간과 영원'의 의미를 생각한다. 100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꺼질 사람의 한살이가 순간이라면, 그 이후는 영원이 아닌가. 영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범부인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저 언덕 너머의 일이다. 만일 있다고 해도 여기 잠들어 있는 사제들이 그 영원의 세계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어떤지도 헤아리지 못한다. 다만 이분들이 순간을 영원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행의 길을 걸었으리란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떡하든 그저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저리게 깨닫는다.
기나긴 역사 가운데서 한 개체에 허여된 생존 기간이란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하다. 정녕 바람직한 인생이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살았느냐에 있지 않을까.
순간을 순간으로 살 것인가, 순간을 영원으로 살 것인가. 이는 각자가 취할 선택의 몫이다. 성직자 묘역은 나에게, 너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 선택의 기준을 말없이 던져주고 있다.
곽흥렬(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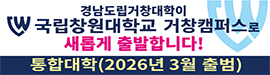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