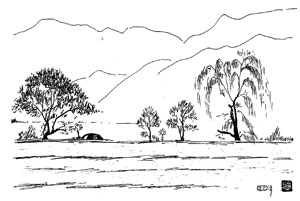
수제비의 어원은 제비에서 온 것 같다. 저녁 무렵 못가에 앉아 제비들이 물 위를 나는 춤사위를 보고 있으면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스케이트 선수들의 군무 같다. 새끼들의 먹이인 잠자리를 낚아챌 땐 더러 물장구를 튀기지만 물에 빠지는 일은 없다.
#날렵한 제비를 닮아(?) 수제비
아주 오랜 옛날 수제비는 변변한 이름이 없었다. 어느 여름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밀가루 반죽으로 죽도 밥도 아닌 그 무엇을 끓이던 어느 아낙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아낙은 문득 물 위를 나는 제비의 날렵한 몸짓을 기억해내고 밀가루 반죽을 물이 끓는 냄비 속으로 던져 넣으며 그것이 제비를 닮았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름을 짓기로 작정하고 밀가루의 '밀'자를 따서 '밀제비'라고 불러보니 어감이 좋지 않았다. 반죽이 물에 떨어진다고 '물제비'라고 작명하니 촌티가 났다. 그래서 어릴 적 배운 한문 실력을 동원하여 '물'자를 '수'(水)자로 바꿔 '수제비'라고 낮게 흥얼거려 보니 그럴 듯했다. 그녀가 '수제비'라고 부른 것이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듯' 전해 내려오는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음식의 어원에 관한 학설이 아니다. 순전히 필자의 상상력이 빚어낸 이야기 한 소절에 불과한 것이다.
#노름쟁이 남편 둔 아낙네의 설움 담겨
김사인 시인의 '부뚜막에 쪼그려 수제비 뜨는 나어린 처녀의 외간 남자가 되어'란 시에는 "그 처자 볕에 그을려 행색 초라하지만/ 가슴과 허벅지는 소젖보다 희리/ 그 몸에 엎으러져 개개 풀린 늦잠을 자고/ 더부룩한 수염발로 눈곱을 떼며/ 날만 새면 나 주막 골방 노름판으로 쫓아가겠네" 이렇듯 수제비는 형편없는 노름쟁이 남정네에 빌붙어 사는 아낙의 가난에서 탄생한 서러운 음식이다.
#수제비나 물수제비나 제비가 원조
앞서 얘기한 '물제비'의 '물'자를 수제비 앞에 갔다 붙이면 '물수제비'가 된다. 물수제비는 얄팍한 납작돌을 물 위로 날려 보내면 '피용 봉 보 보 보' 하며 힘이 부칠 때까지 날아가다 주저앉는 재미있는 물놀이다. 물수제비 놀이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있었지만 근년에는 싱거운 미국인들이 텍사스 블랑코 강에서 대회를 열어 38회의 수제비를 뜬 제르돈 콜만 맥기라는 사람이 우승했다고 전해진다. 수제비거나 물수제비거나 간에 그 원조는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제비가 원조임이 분명하다.
#밀반죽은 인에서 아웃으로 던져야 정확
제비가 먹이를 추적할 땐 스트레이트로 날아가야 잠자리를 낚아챌 수 있다. 수제비의 밀반죽은 물 묻은 손끝에서 인에서 아웃으로 던져야 끓는 물에 정확히 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물수제비는 아웃에서 인으로 뿌리듯이 던져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는 골프에서 말하는 '슬라이스를 내지 말고 훅을 걸어야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수제비에 관한 명상을 쓰다 보니 중복게재와 표절 시비로 부끄럼 칠갑을 하고 있는 학자들의 논문보다 더 순수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화자찬은 상놈이나 하는 짓거리지만 나는 이렇게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더러 있다.
#거섭은 호박잎으로 치대 푸짐하게
어머니는 여름 점심을 수제비로 때울 때가 많았다. 밀반죽은 제대로 숙성시켜 쫀득쫀득할 것과 거섭은 반드시 호박잎을 문대고 치댄 후에 푸짐하게 넣을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수제비에 호박잎을 넣으면 부추보다 더 시원하고 감칠맛이 난다. 여름이 달려오고 있나 보네. 수제비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금호강으로 나가 시 한 수 외우며 물수제비나 뜨고 싶다.
"내게 일이 있다면 그것은 노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곧 죄일 때/ 그저 노는 것은 얼마나 정당한가!/ 스스로 위로하며 치하하며/ 섬진강 산 그림자 위로/ 다시 물수제비를 날린다/ 이미 젖은 돌은 더 이상 젖지 않는다"(이원규의 시 '독거' 중에서)
구활(수필가 9hwal@hanmail.net)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