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 짧은 만남, 한 노인 "어느 한국에서 왔냐" 질문에
분단국가의 '힘든 역사' 새삼 느껴져, 남과 북의 경계 빨리 허물어졌으면…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지 사흘째, 몇 시간 후면 바이칼 호반의 도시 이르쿠츠크에 내린다. 창밖으로는 설원과 자작나무 숲의 단조로운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한겨울의 횡단열차에서는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다. 총명한 인상의 청년이 우리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 하얼빈에서 온 사진작가라고 자기를 소개한 청년은 매년 여행을 한 후 개인 사이트에 기록하고 있단다. 올해는 러시아 극지 여행을 나섰다며, 자체 제작 현수막에 인사말과 서명을 부탁한다. 그의 젊음과 용기에 축복의 말을 써주는데 뒤쪽에 무리 지어 있는 예닐곱 명의 동양인들에게 눈길이 간다. '북조선'에서 온 것임이 틀림없는 이들은 경계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면서, 평양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다. 어디까지 가느냐는 물음에 인솔자의 눈치를 보며 모스크바라고 짧게 대답한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난다. 모스크바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북한에서 많이들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4인실 쿠페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는데, 한 노인이 열린 문틈으로 '어느' 한국에서 왔느냐고 묻는다. '남쪽'이라는 말을 듣고 말없이 뒤돌아서는 그를 객실 밖으로 따라나갔다.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노인은 1985년 김일성의 소련 방문 당시, 루진에서 우수리스크까지 주석 전용 열차를 몬 수석기관사였단다. 나중에 인삼주까지 선물로 받았다고, 아직도 그 병을 간직하고 있노라고 자랑한다. 자기가 사는 우수리스크엔 중국인도 많지만, 한국인도 많고, 여고생인 손녀는 한국어를 잘해서 상도 받고 작년엔 서울까지 다녀왔다고 그는 덧붙인다.
횡단열차에서의 만남은 우리가 '섬 아닌 섬'으로, 여전히 분단국가로 살고 있음을, 이 북국이 우리 민족의 힘든 역사의 순간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고종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했던 1907년, 이준은 부산에서 배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간도에서 활동하던 이상설과 만나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여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다. 주러 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이 그곳에서 통역 겸 안내자로 합류하여 세 명은 함께 네덜란드로 떠났다.
조선 말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어 북쪽 땅으로 흘러갔던 유민들은 겨우 살 만해진 1937년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일제의 밀정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많은 고려인 인텔리들이 총살되고, 민초들은 극동에서 쫓겨나 횡단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짐짝처럼 포개진 채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는 긴 여정 도중 굶주림과 추위에 다수의 노약자들이 숨을 거두었고, 고려인들은 죽은 자식과 부모의 시신을 기차 밖으로, 시베리아 이름 모를 곳에 던져버려야만 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머나먼 중앙아시아에 내쳐졌던 이들은 척박한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내지만, 반세기 후 소련 붕괴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어진 민족주의 정책으로 그곳에서 다시 버려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첫 세대의 러시아 이주 이후 150년, 여전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한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을 몰아냈던 러시아 땅으로, 연해주로, 피의 조국인 한국으로 또다시 떠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바이칼로 향한다. 잃어버린 국권을 찾기 위해 비장한 길을 나서는 것도 아니요, 춘원의 소설 '유정'의 주인공들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도피하는 것도 아니며, 자기 땅을 떠나 떠돌아야만 하는 디아스포라의 운명은 더욱 아니다.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서도 오지이자 반역자들의 유배지라는, 또는 민족의 시원지라고도 하는 바이칼 호수를 보러 간다. 추위도,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경계도 내 발로 넘을 수 있는 코즈모폴리턴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횡단열차에서의 짧은 만남은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또는 분단의 역사가 현재진행형임을 체감하게 한다. 우리나라를 대륙 속 섬으로 만들고 있는 남과 북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와 피를 나눈 고려인들의 유랑이 계속되는 한, '어떤' 한국에서 왔느냐는 질문은 계속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윤영순 경북대 교수·노어노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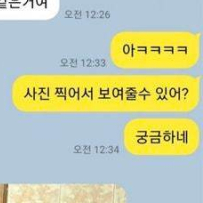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