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에 등원한 국회의원들 입에서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잠시 솔깃했었다. 앞선 19대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이든, 새롭게 국회에 발을 디딘 의원이든 모두 지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니 '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도 품어봤다.
비록 '지각 개원' 관행은 이어갔으나, 그래도 최근 30년 이래 가장 이른 시일에 개원식(국회 임기 개시 9일 만에 원 구성 협상 타결'국회의장단 선출 2일, 상임위원장 4일 지각)을 했으니 기대를 이어갈 만했다.
예전 사례를 보자. 15대는 39일, 16대는 17일, 17대 때는 36일이나 법정 시한을 넘겼고 18대에는 원 구성을 마치는 데 무려 88일이나 걸렸다. 19대 때도 국회 문이 열린 건 임기 개시 후 33일이 지난 뒤였다.
더 고무적이었던 건 20년 만의 3당 체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 빚어낸 결과물이어서였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던가.
첫 '작품'은 '꼼수'와 '관행'으로 채워졌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교통정리가 어렵자 기껏 생각해낸 게 임기 쪼개기였다. 상임위 배정도 전문성은 뒷전인 채 선수(選數)와 지역 배분을 우선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 정무위, 미방위 등 전략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갰다. 국방위, 정보위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을 두 의원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어긴 것이니 머리를 썼다.
상임위원장 후보 간 '1'1'2년 조율'은 첫해 상임위원장은 1년 뒤 자발적 사임을 하고 두 번째 상임위원장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겠다는 암묵적 약속이다. 국회법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이자 그들만의 '짬짜미'다.
'1년짜리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이라는 '대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상임위 배정도 그러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법제사법위에, 전 식약처장을 안전행정위에 배정했다. 황당한 사례는 더 많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무대인 상임위 배정이 경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권력과 이권 배분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 국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외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끼리끼리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꼴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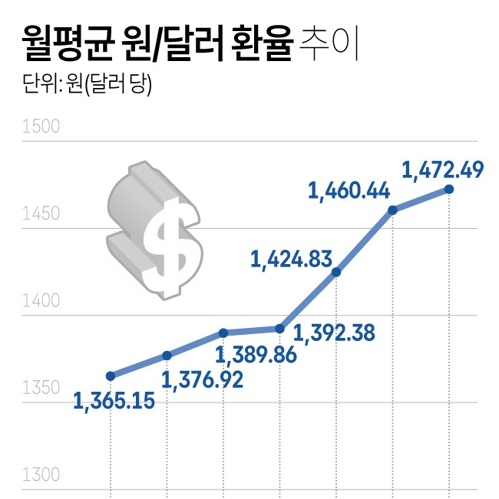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