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북구 함지산 맞은편 매천초등학교 뒤편으로 아담한 산 하나가 눈에 띈다. 태복산이다. 매천동, 태전동 주민들에겐 익숙한 이름이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겐 낯선 산이다. 산 이름이 '태복'(胎服)이니 왕실의 태실(胎室)제도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왕자의 태를 묻은 곳이라면 명산이나 지기(地氣)가 뛰어난 산일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희미하고 지세에 뚜렷한 특징이 없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산행 종점인 사수재는 많은 사연을 내포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개다. 역사에, 특히 조선 사림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한 번 올라보기 추천한다. 북구 매천동 태복산과 사수재(금호지구)를 연결하는 종주코스를 다녀왔다.
◆중종 왕자 태 묻었다는 기록 보여=태복산~사수재 구간은 7㎞ 남짓한 종주코스로 대중교통과 쉽게 연결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매천역에서 내려 매천초교 옆 카센터를 끼고 왼쪽으로 돌면 바로 등산로가 나타난다.
야트막한 산자락에 올라서면 서쪽으로 매천'팔달동 시가지가, 북쪽으로 명봉산과 팔공산 서쪽 능선이 펼쳐진다. 등산로는 잘 닦여 있는 편이고 근래 표지판이 정비돼 큰 어려움 없이 종주를 마칠 수 있다.
매천동 쪽 정상인 태복산(194m)은 들머리서 40여 분 거리에 있다. 정상석은 없고 누군가 써놓은 종이코팅지가 표지판을 대신하고 있다.
산에 오르기 전 검색을 해보니 주변에 태묘, 태실과 관련된 기록이 몇 군데 보였다. 동명 부근에 태봉산(胎封山)이 있는데 이곳에 중종 왕자 봉성군의 태를 묻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아마도 태실은 동명 쪽 태봉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봉산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태복산 이름을 따로 붙인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설에는 '태봉산' 지명과 혼동한 것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태실과 별도로 출산 때 나온 옷(服)을 따로 묻어 태복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전한다.
◆한강(寒岡) 정구, 정인홍 핍박 피해 사수재로 피신=태복산 정상에서 왼쪽으로 길을 접어들어 20분쯤 진행하면 삼거리가 나온다. 왼쪽으로 가면 잠산을 거쳐 장대실마을~팔달교에 이르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백세공원, 사수재 방향이다.
산에 오르기 전 가장 궁금했던 점은 사수재 명칭의 유래였다. 언뜻 생각에 사냥과 관련한 사수(射手)재가 아닐까 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도 지명 내력을 찾을 수 없었다. 등산로 입구에서 송귀익(77'대구시 침산동) 씨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송 씨로부터 사수재 유래는 물론 태복산의 내력에 대해 소상히 알게 되었다.
사수재 역사는 뜻밖에 정인홍(鄭仁弘)과 정구(鄭逑)가 활약하던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광해군 이후 조정 실권을 장악했던 정인홍(합천)은 정적이었던 정구(성주) 세력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탄압을 피해 한강(寒岡'정구의 호)이 피신한 곳이 사수재, 사수동 일대였다. 처음 한강은 금호강이 굽이치는 언덕에 사수재(齋)라는 재실을 짓고 시름을 달랬다. 재실에 올라서면 합천 오도산, 덕유산 자락까지 다 보여 고향인 성주 쪽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랬다고 한다. 이 재실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고 지천면 일대에 구릉이었던 사수재(峙)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송 씨는 사수재 명칭에 대해 '주자학을 일으킨 주희의 고향이 사수여서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문헌을 뒤져보니 사수는 중국의 노나라 북쪽 지방 사수(泗水)로 공자의 묘가 있었던 곳이었다. 아마 이것이 '사수재 유래'의 정설이 아닌가 한다.
◆정치 망명객 살던 동네 대단지 아파트=백세공원, 대구사격장을 지나면 산은 사수동으로 접어든다. 사수동 하면 낯선 지명인데 서재위생매립장 맞은편 금호아파트지구를 생각하면 쉽다.
사수동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한 분 있다. 아헌(啞軒) 송원기 선생이다. 선생은 칠곡 출신으로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과 교유했다. 임란 때는 군량미 모곡의 공(功)을 인정받아 선무원공신에 임명되기도 했다. 광해군 폭정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배척되면서 정치적으로 소외돼 칠곡으로 낙향하고 만다. 사수동에 먼저 낙향해있던 아헌은 후에 한강이 정치적으로 몰리자 이곳으로 불러 같이 은둔생활에 들어갔다.
태복산을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에 어느새 역사 현장인 금호지구 뒤편에 이르렀다. 뒷산 입구에서 삼거리 이정표가 막아선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내곡근린공원을 거쳐 금호지구로 내려가고 직진해서 2.7㎞를 더 가면 오늘 산행의 종점 사수재다.
사수재 가는 길은 등산로가 험하고 인적이 드물어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다. 사수재에서 만난 한 산꾼은 "옛날 사수재는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북적였는데 지금은 전기시설만 어지럽다"며 "나 같은 50대들이 옛 추억을 더듬으며 가끔 들를 뿐 대부분 이곳이 사수재인 줄도 모른다"고 말한다.
사수재를 지나 금호지구로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수많은 위인, 인물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명멸해 갔듯 재나 고개도 시대적 부침(浮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조선 중기 영남의 사림 중심지 중 하나로 번창했던 합천도 옛날의 영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수재를 끼고 있는 금호지구도 마찬가지. 400년 전 정치 망명객들이 우울한 술잔을 기울이던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줄 누가 알았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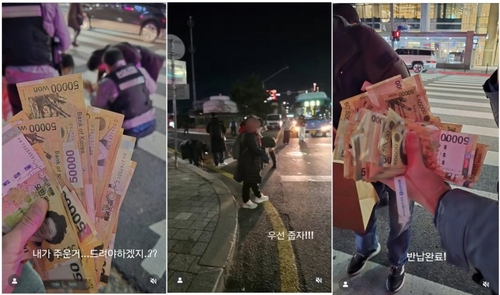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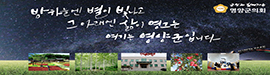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김남국 감싼 與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책임진 모습 칭찬 받아야"
TK신공항 2030년 개항 무산, 지역 정치권 뭐했나
동력 급상실 '與 내란몰이'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李 대통령 지지율 62%…장래 대통령감 조국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