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는 수백만 년이라는 긴 여정의 드라마 속에서 살았다. 그 삶에서 다양한 흔적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산성 토양이 우세해 야외 유적에서 나무, 가죽, 뼈 등 유기질로 만든 유물이 잘 남지 않는다. 박물관 전시품 중 석기가 많고 구석기시대 때 석기만 출토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흑요석(obsidians)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천연 화산 유리질로, 검거나 갈색을 띤다. 이것은 화산지대에서만 나는 돌이지만, 화산지대라고 무조건 흑요석이 산출되는 것도 아니다. 필요했지만 구하고 발견하기 힘든 돌이었다.
흑요석은 떼어내면 아주 날카로운 날을 가진다. 수술용 칼인 메스에 버금간다. 선사시대에 찌르개(창), 좀돌날, 화살촉, 칼 등에 사용된 이유이다.
일본 조몽시대 때는 토기 안에 도끼와 흑요석을 넣어 신에게 바치기도 했다. 나가노현에서는 흑요석 채굴지가 발견되었다. 세계적으로 흑요석은 도구의 기능을 넘어 상징적, 의례적 기능을 가진 신성한 돌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같은 보석이 더 귀한 취급을 받는다. 보석의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 변화되어 왔다. 물건의 가치는 사람의 생각과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선사시대 때 흑요석은 보석만큼의 교환가치를 지닌 최초의 돌이었다.
한반도에서 흑요석은 후기구석기시대, 구체적으로는 3만 년 전 이후부터 사용했다. 중기구석기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다. 한반도 남부에선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돌이며, 산지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흑요석이 나오는 곳은 일본과 연해주, 그리고 백두산이다. 한반도로 좁히면 명확한 흑요석 산지가 밝혀진 곳은 백두산뿐이다. 중국 랴오닝성 지린 지역의 백두산 주변 구석기 유적에서는 40㎝가 넘는 크기의 원석들도 발견된다. 하지만, 무거운 석기제작용 석재는 원산지로부터 멀어질수록 크기가 줄어든다. 특히 200㎞를 넘어서면 급격히 작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백두산에서 육로로 700㎞ 떨어진 대구 월성동에 흑요석이 확인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후기구석기시대 때 흑요석 원산지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흑요석 이동 거리는 대체로 400㎞를 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 내 선사시대에 가장 멀리까지 이동되어 사용된 흑요석이 바로 백두산 흑요석이다. 이 흑요석은 최대 800㎞까지 떨어진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선사인들에게 백두산은 흑요석의 메카이자 보물창고였다. 백두산 흑요석은 우리가 밝혀낸 것보다 알아내야만 하는 숙제를 더 많이 안고 있다. 무게 약 85g의 흑요석을 얻기 위해 월성동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 아마도 사슴 2마리, 멋진 동물가죽을 주어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대구 월성동 구석기유적의 흑요석은 364점이다. 다른 곳에서 한 번 이상 다듬어진 채 유적 안으로 반입되었다. 후기구석기의 특징은 가볍고 작다. 이동 생활을 위해 줄일 수 있는 건 크기를 최대한 줄여야만 했다.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흑요석을 이용한 도구였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연구 결과 대구 월성동 구석기유적의 흑요석이 백두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남권 흑요석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만 년 전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걸었던 '흑요석의 길과 먼 여정'을 밝히는 첫 단추도 이제 끼웠다.
구석기인들은 길을 보는 눈, 물건을 보는 혜안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오랜 시간 진화하면서 보는 안목도 함께 발전했다. 돌을 고르는 신중함은 우리 유전자 속에 배어 있다. 월성동 구석기인의 높은 안목을 배워 흑요석의 길을 알아낼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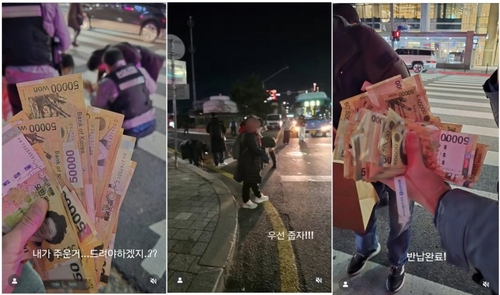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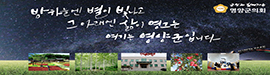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김남국 감싼 與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책임진 모습 칭찬 받아야"
TK신공항 2030년 개항 무산, 지역 정치권 뭐했나
동력 급상실 '與 내란몰이'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李 대통령 지지율 62%…장래 대통령감 조국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