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필라델피아'의 결말이다. 배심원 평결을 모두 들은 판사는 앤디(톰 행크스)를 해고한 로펌에 미지급 임금 14만달러, 위자료 10만달러 외에 징벌적 배상금 478만달러 등 모두 502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한다. 에이즈를 이유로 무능한 변호사라는 굴레를 씌워 명예를 짓밟고 차별한 대가다.
이 영화는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가 토대다. 당시만 해도 에이즈에 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우리 관객에게 더욱 낯설게 다가온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는 결정이다.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는 별도로 재발을 막기 위해 물리는 손해배상을 뜻한다. 18세기 후반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널리 인정하는 제도다.
한국 등 대륙법 체계의 나라는 다르다. 우리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거나 제도 악용, 기업 활동 위축 등이 이유다. 하지만 거대 에너지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를 고발한 '에린 브로코비치' 등 관련 영화가 이어지고, 국내서도 제도 도입의 공감대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그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했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을 일으킨 '옥시' 사건과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한층 높아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에 미국이 모두 167억달러의 배상금을 물린 것도 큰 자극제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우리는 부당한 권력과 그 권력을 등에 업은 기업집단의 민낯을 목격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탄식의 뿌리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청와대 압박에 못 이겨 삼성물산 주식 매각을 500만 주로 낮춰주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상꾸라지'(상법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뜻)들이 계속 처벌을 면한다면 과연 공정한 일인가.
'필라델피아'에서 주인공 앤디의 어머니는 "나는 내 아들에게 그냥 버스 뒷자리에 앉아만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그 용기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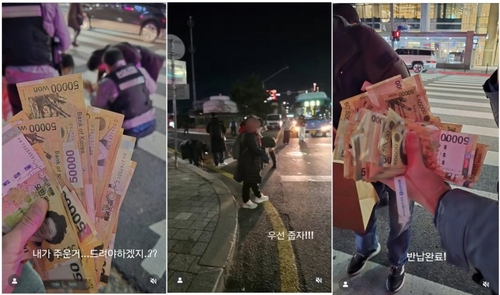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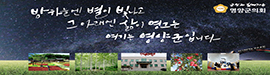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김남국 감싼 與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책임진 모습 칭찬 받아야"
TK신공항 2030년 개항 무산, 지역 정치권 뭐했나
동력 급상실 '與 내란몰이'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李 대통령 지지율 62%…장래 대통령감 조국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