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 (문성해 지음/문학동네)
눈길 주는 곳마다 신록이다. 푸름이 짙어 가는 그만큼 날씨도 무더워지고 있다. 빙과류가 수시로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는 것이다. '설레임'이라는, 짜서 먹는 얼음과자가 있다. 그 이름 때문에 마트 냉장고의 많은 빙과류 중에 사람들 눈에 쉽게 잡히는 이 '설레임'과, 그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는 사람들의 마음 저변을 지나치지 못하는 시인이 있다. 문성해 시인이 그렇다.
"……이토록 차고 투명한 것/ 이내 손바닥이 얼얼해서/ 금세 놓아주어야 하는 것// 얼얼한 심장 한쪽이/ 설레는 무게는 딱 이만하고/ 그것을 한 덩이로 얼리면 딱 요만하고// 너는/ 여름을 최초에 얼린 이처럼/ 열로 들뜬 나의 손안에/ 한 덩이 두근거림을 쥐여주고/ 쓰레기통에는/ 설렘을 다 짜낸 튜브 같은 심장들/ 함부로 구겨져 버려져 있다."(69쪽 「설레임」 부분)
위 시집에 실린 이 시는 시인 내면의 웅얼거림도 아니고, 가슴 찢는 포효도 아니다. 현학적이거나 몇 겹씩 꼬인 수수께끼 같은 구절도 없다. 빙과 '설레임'에 감정 '설렘'을 잘 투영하여, 하나의 시제로 경계 없이 끌고 갈 뿐이다. 빙과 '설레임'을 보던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때 두근거림을 쥐여주던 그 감정이 자신에게도 있었음을 더듬게 된다. 이제는 그 감정을 다 짜낸 튜브 같은 자기 심장을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들을 깊고 세밀한 시선으로 길어 올린, 이런 시편들로 빼곡한 이 책은 문성해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이다. 1998년과 2003년에 각각 매일신문과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은 일상의 소외된 것들을 따스하게 그려낸다는 평을 들어온바, 이 시집에서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사소한 것들에 눈길 주고 마음 보태어 옆 사람에게 말 건네듯 조곤조곤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잘 벌고, 잘 먹고, 잘 나가는(해외로) 이야기로 넘쳐난다. 돈과 무관한 일에 몸과 마음을 기울이면 무능한 현실 부적응자로 치부되기 일쑤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인은 '대책 없이 막 사는 인간'(「사나운 노후」)이 된다. 그럼에도 문성해 시인은 자신만의 시선과 언어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쏟는다. 그가 들려주는 노래에서 독자들은 생각지 못한 무언가를 만날지도 모른다.
초여름과 새 지도자의 열기가 대지를 달구는 이즈음, 나날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도, 먹고사는 일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뒤처진 인간이 되지 않는 사회를 꿈꿔 본다. 함께 꿈꾸고 싶은 이들이 이 시인의 감성과 사유를 맛보는 즐거움도 함께하면 좋겠다. '빨갛고 뾰족한 끝이 먼 어둠을 뚫고 횡단한 드릴'(「조그만 예의」)인 고구마나, '빙하기도 산사태도 지나며 돌이 짓는 옷'(「돌이 짓는 옷」)에 대한 숙연함도 만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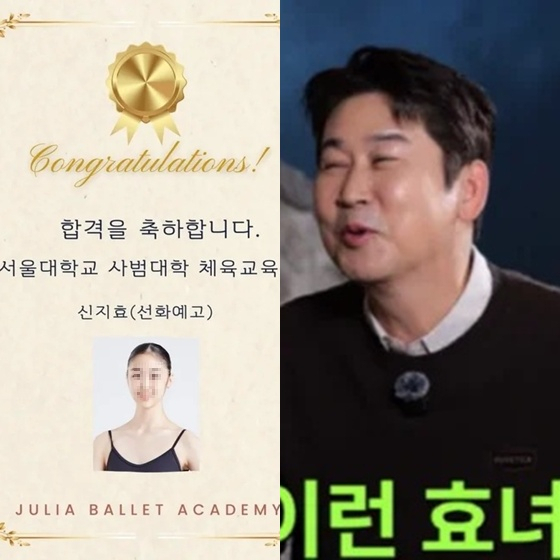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