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5일 편성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일자리 만들기만을 목적으로 한 추경안이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보수 야권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추경이 확정될 경우 문재인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 공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실효성과 역작용 등에 대한 논란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사업이 지방 재정에 적지 않은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임금 부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정부 계획과 관련 규정상 지방공무원 확충과 소외 계층 대상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드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의 핵심인 7천500명의 지방공무원 채용 이후 발생하는 수당, 출장'활동 경비 등을 항목별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달갑지 않다며 동참에 소극적일 경우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간 불균형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3조5천억원을 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에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돈은 원래 국세 수입 증가분에 따라 지방에 돌아갈 몫이다. 어차피 지방정부로 가야 할 돈이 이름만 '일자리 예산'으로 바뀌어 배정되는 것일 뿐 추가 재정 지원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꼼꼼한 준비 없이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 사업을 조급히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과 여러 복지 사업 등을 통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방정부가 허리 휘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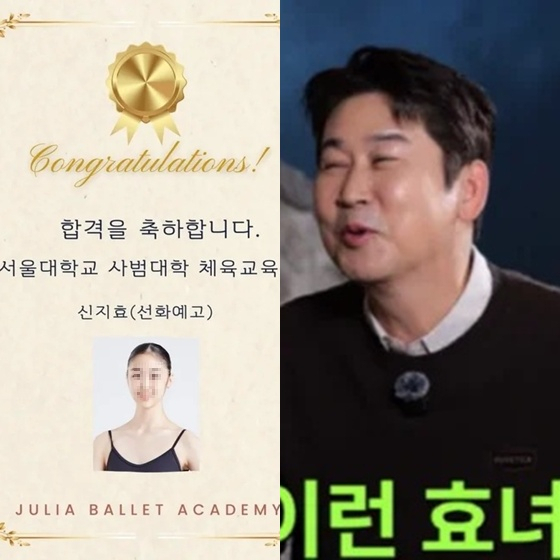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