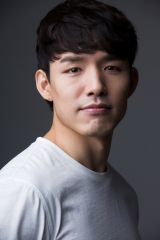
무명배우의 글을 기고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 관객 분들을 만나왔지 지면을 통해 독자(관객)분들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편으로는 연극을 하는 무명배우의 사색이 글로써 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읽힐지 또는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흔적을 진지하게 남겨보는 묵상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람하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오늘날 신문 지면의 글은 과거와는 다르게 별 볼일 없는 삶의 퇴적물로 남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각자의 휴대폰으로 의사소통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보를 파악하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 주어진 시간동안 우리는 얼마나 직접 글을 쓰고 읽어볼까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연극'도 신문 지면의 글과 유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극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대중예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극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영상매체가 등장하고 발전하면서부터 연극은 자연스레 관객들의 흥미를 잃어갔고 과거에 비해 극장으로의 발걸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을 시장경제와 실용주의 관점에서 연극을 바라본다면 연극은 상업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활용하는 재원에 비해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연극에 도가사상가인 장자(莊子)의 사유를 대입해보려 합니다. 바로 '장자'의 인간세편(人間世篇)에 나오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는 말입니다. 지면에는 한계가 있으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풀이해보자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들여다보면 쓸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사람들에 의해 베어지고 뽑혀지지만 못생기고 투박한 나무는 사람들에게 뽑히지 않은 채 나무 본연의 몫을 지녀 자연을 이룬다는 풀이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사유는 연극이 마주한 작금(昨今)의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적 관점을 정립하게 합니다.
오늘날 연극이 장자의 사유와 맥을 함께 하는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극은 인간과 인간이 한 공간에서 만나 관계를 맺고, 호흡하고,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원시적인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가치들과 더불어 가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숭고함을 지닌 것 같습니다.
매일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쓸모없어 보이는 '무용지물'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일상과 주변을 반추해본다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무용지용'을 발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 연극배우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