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성근 울타리와 대문 위로 무성한 박 넝쿨이 뻗어 있다. 박꽃이 피었으니 여름날 저녁 무렵이겠다. 사립문 안으로 장독대가 보이고 문 앞에는 농가 삼대의 가족이 있다. 선선한 바람을 기다려 문 앞에 삿자리를 깔고 더위를 식히는 중에도 부지런한 가장은 짚신을 삼는다. 다 만든 한 짝을 옆에 두고 짝을 맞추어 가며 삼는다. 닳아 없어지는 생필품인 데다 짚이 흔한 농가에서는 다들 만들어 짚신 삼는 장면은 풍속화에 자주 나온다. 김득신의 '한여름 짚신 삼기'는 허리에 고정한 끈을 발바닥에 걸어 짚신 바닥을 엮고 있는 모습인데, 윤두서의 그림을 보면 끈을 발바닥이 아닌 엄지발가락에 걸고 있어 좀 다르다.
나이든 아버지는 가장인 아들의 손끝을 유심히 보며 요령을 알려주는 듯하고, 어린 아들 또한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아버지 손끝을 보고 있다. 인물의 배치와 생김새, 동작이 자연스럽다. 그 옆의 검둥이도. 가장은 아버지에게 배워 아들에게 짚신 삼기를 가르쳤을 것이다. 이 기술은 짚신과 함께 사라졌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의 삶이 이어져 오늘 우리 모습이 되었다. 막연한 조상, 옛사람, 조선 사람의 호흡이 느껴지는 듯 실감나는 것이 풍속화의 정겨움이다.
이 그림을 그린 김득신은 9년 선배인 김홍도가 활짝 열어놓은 풍속화의 신세계에서 활약한 화원화풍 풍속화의 대가이다. 평지돌출로 등장한 김홍도와 달리 김득신은 화원 명문가 출신이다. 아버지 김응리와 외할아버지 한중흥, 삼촌 김응환, 동생인 김석신과 김양신, 아들인 김건종, 김수종, 김하종 등이 모두 유명한 화원이다. 가업을 대물림하는 기술직 중인 집안이 많았지만 개성 김씨처럼 실력 있는 화원을 많이 배출한 예술가 가문은 드물었다.
조선시대 화원은 담채를 활용하는 기술이 탁월했다. 궁궐의 장식화나 사찰의 종교화, 여염의 민화 등은 진한 원색을 사용했지만 감상화는 대부분 수묵이나 담채였다. 검소함을 가치 있게 여긴 나라였던 조선의 화가들은 색채의 화려함을 억누른 담채화에 숙달될 수밖에 없었다. 최소치의 색채 효과인 담채는 값비싼 물감을 물을 타 연하게 사용하므로 재료 절감 효과도 있었다. 더벅머리 손자의 핑크빛이 살짝 도는 얼굴색, 상투도 없는 민머리인 할아버지의 얇아지고 옅어진 피부, 머리털이 사방으로 뻗치는 씩씩한 가장의 혈기 왕성한 피부색 등은 몇 그램의 물감만 있어도 못 나타낼 것이 없는 김득신의 노련한 담채 실력을 잘 보여준다. 보물 제1987호인 김득신의 풍속도첩(8점)에 들어있는 그림이라 따로 낙관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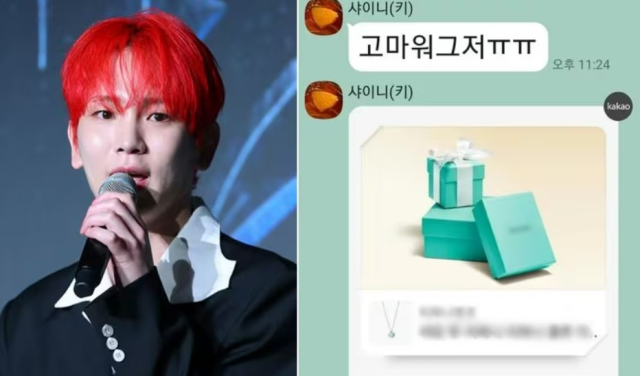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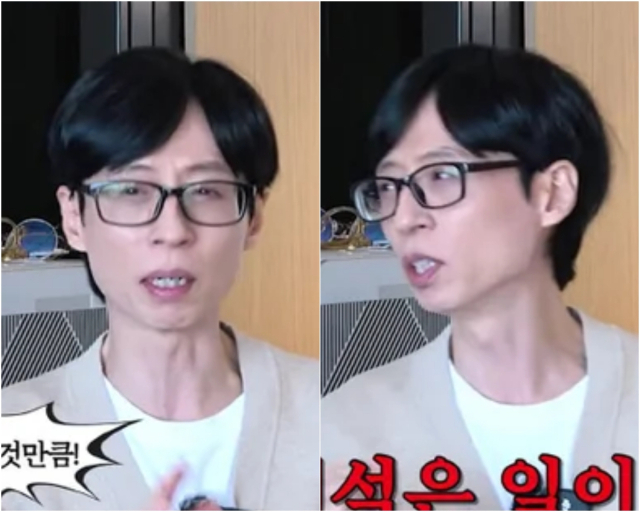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