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 먹었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보릿고개 넘기 힘든 시절 고향마을을 떠올리면 실제로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런 인사말은 듣기 어려워졌다. 그 말이 갖는 외연적·내포적 의미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일부러 안 먹는' 세상이다.
"이겼나?" 테니스 게임이 끝나 지쳐서 자리로 돌아오는 필자에게 그 친구는 꼭 이렇게 묻는다. 뭐라고 대답하면 그는 또 "몇 대 몇"이냐고 되묻는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낯설지 않게 보는 풍경이다. 필자 역시 드물기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묻기도 한다. 이 친구는 평소 그렇게 승부에 집착하는 성격이 아님을 잘 알기에 그저 습관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기고 말지만, 입맛이 그리 개운치는 않다.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스포츠, 그것도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생활체육'에서 왜 경기의 결과가 중요시될까? '밥 먹었느냐'고 의미 없이 묻는 인사말과 달리, 왜 우리는 굳이 승패를 궁금해 하며 '이겼느냐'고 묻는 것일까?
운동신경이 둔한 필자는 십 수 년째 테니스를 즐기고 있지만 솜씨는 썩 좋지 않다. 그래도 그 덕분에 그럭저럭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된 셈이다. 필자는 테니스 게임을 즐기면서도 속으로는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테니스 시합은 '운동하기' 위해 우연히 선택된 하나의 방편일 뿐, 그 결과가 목적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종목이든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보다-물론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한다!-비지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운동이 주는 참 기쁨은 거기에 있으며, 우리네 인생살이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좀 된 이야기지만, 국내 굴지의 어떤 재벌 그룹은 한때 '세계일류 신경영'을 표방하면서 "세계는 1등만 기억합니다"라는 기업광고를 세간에 유행시킨 적이 있다. 그러자 당시 어떤 개그맨은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로 그 광고에 대한 일반의 반감을 대변했었다. 세계 일류로 가는 성장통이라기에는 씁쓸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사회 흑역사의 한 단면이었다.
일류는 1등도 10등도 될 수 있는 것, 적어도 생활 스포츠에 있어서만큼은 이기는 것을 금과옥조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필자는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통해 필자의 몸이 그저 한가롭게 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이 탓인지 살아갈수록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을 느낀다. 만약 다음 모임에서 그 친구가 필자에게 "게임 재미있더라!"고 말한다면…. 대박! '소이부답 심자한(笑而不答 心自閑)', 이태백이 따로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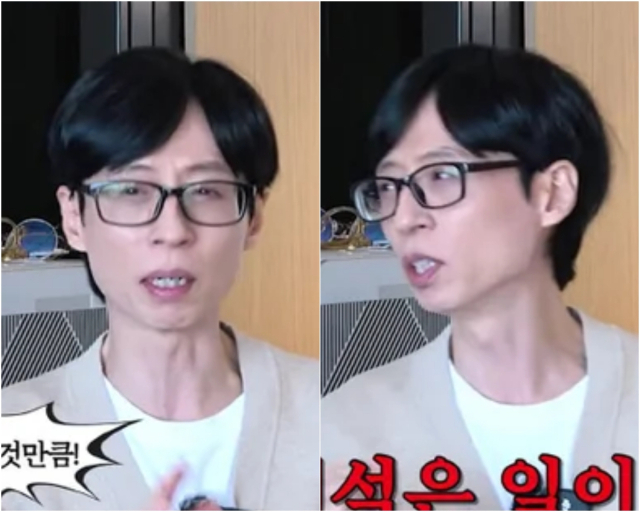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