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북한에 3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놓고 '합의서' 사본을 공개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아니라고 하고, 이 문서를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 문서고를 뒤지지 않는 한 현재로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판단'을 해 볼 실마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우선 합의서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응이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는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답변의 변화는 박 후보자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낳는다. '사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특히 그렇다. 이는 무슨 뜻인가. 북한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니 사인도 할 일이 없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합의서에 누군가는 사인했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뜻인가. '기억이 없다'도 마찬가지다. '합의'와 '사인'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대북 사업을 주도해 온 박 후보자가 '기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판단'의 또 하나의 실마리는 김대중 정부 때 현금 9억달러, 현물 11억달러 등 20억달러가 북한에 흘러간 사실이다. 여기에 5억달러가량의 대북 송금을 합치면 25억달러가 된다. 진위 논란에 있는 '합의서'상의 액수 30억달러에 못 미치지만, 이 돈이 단기간에 북한에 지원됐다는 사실은 25억달러와 '합의서'가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실이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의 지명 이후 대북 비밀 송금을 한 인사를 어떻게 국정원장에 앉히느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합의서 진위 공방은 이런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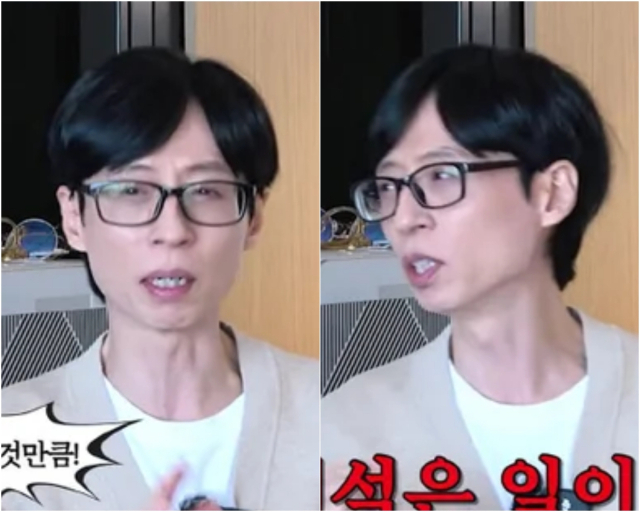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