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두 작가가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를 보고 말했다. "나무들은 계속 한 자리에만 머물러있어야하네. 심심하겠다." "아니야, 쟤네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
인간의 입장과 나무의 입장에서 바라본 각기 다른 대답. 방천시장에 위치한 예술상회 토마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부끄럼쟁이들'은 그 대화에서부터 출발했다. 박지훈, 이연주 작가는 때로는 자연 속에 스며들어서, 때로는 한걸음 물러나 자연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각자의 얘기를 펼친다.
이연주 작가의 작품 속에는 항상 산이 존재해왔다. 달성군 서재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시선 속에는 항상 산이 있었고,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은 바뀌지만 언제나 한 자리에 우직하게 머물렀다.
그러다 그는 누워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혹은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익숙한 산의 형태를 발견한다. 그때부터 산과 사람의 이미지를 중첩해, 자신에게 산과 같은 의미의 사람들을 산 그자체로 표현했다.
"내 곁에 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하는 애정의 마음을 담은 작업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고 나서 큰 아픔을 겪었고, 더 이상 이상을 좇으며 눈 앞의 대상만을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늘 곁에 머무르던 대상의 부재와 그로 인한 상실감은 작업에 큰 변화를 줬다. 최근 작업들은 멀리서 조망한 원경보다 대상의 모습을 확대해 포착한 근경의 구도가 주를 이룬다. 대상 자체의 모습보다 자연을 닮고싶어 하는 인간의 부분적인 모습만 극대화해 나타낸다.
그는 "이전에는 산 같은 누군가를 그리거나 이상적인 존재로서 산을 표현해왔지만, 인간은 인간일 뿐 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영원히 그 자리에 있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잠깐 머물렀다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작가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본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발견한 '부조화'. 인간 혹은 자연이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는 듯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제각각의 얘기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
그는 "불균형 속에서 결국 또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조화롭게 볼 수도, 부조화스럽게 볼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작업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인물 등 특정 대상이 화면에 등장했던 이전 작품과 전혀 다른 방식의 작업을 처음 선보인다. 그에게도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인 셈. 마치 인간의 세포나 꿈 속의 세계 같은, 다양한 색감과 알 수 없는 형태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다.
"이전에는 서사나 감정이 부각되도록 구도, 표정, 제스처 등 연출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물론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었지만, 이번엔 그걸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박 작가는 "작품을 봐주는 분들이 대체 이게 뭘 그린건지 몰랐으면 한다"며 "눈으로 인지하는 것과 머리로 인지하는 것의 간극이 있다는 게 매력적이고, 그것이 오히려 작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두 작가의 전시 '부끄럼쟁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종이 리플릿 대신 QR코드를 활용하고, 작품 판매수익의 일부는 환경단체에 기부한다. 월요일 휴관. 053-555-0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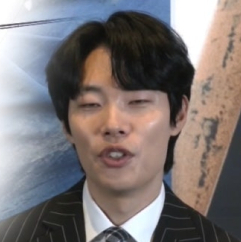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도발적 전쟁시연, 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도"
북한,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강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