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제조업은 지금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기업들은 엄격한 노동법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워라벨 추세로 4.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일본에서 배운 노하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이점은 중국의 부상으로 사라졌다.
중국은 2018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25% 관세를 맞았음에도 대미 무역 흑자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2024년 중국의 대미 흑자는 약 29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체 무역 흑자는 9,9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으로 추가 관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중국은 기존 25%에 추가로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중국 역시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저비용 중국' 시대가 끝났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국가 주도로 스마트 팩토리를 육성해왔다. '불 꺼진 공장'으로 불리는 다크 팩토리(Dark Factory)는 사람 없이 24시간 7일 내내(007 패턴) 가동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AI, 로봇, 5G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2024년에 이미 500개 이상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5년에는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과감한 국가 지원 덕분이다.
중국 정부는 자동화·AI 관련 R&D 비용에 150%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고기술 기업의 법인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다크 팩토리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국가 차원에서 500만~2000만 위안(약 9.8억~39억 원), 지방 정부에서 300만~1000만 위안을 지급한다. 또한 정부 조달 우선권과 상장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조치가 뒤따른다.
중국은 과거 25% 관세는 '인터넷+'로 넘었지만, 추가 30% 관세 장벽은 'AI+', 즉 AI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뛰어 넘을 생각이다. 2024년 중국의 전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점유율은 54%에 달하며, 설치 대수는 27.6만 대를 기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은 세계공급망의 56%를 장악하며 미국과 경쟁 중이다. AI에서도 미국의 AI 칩 공급 통제에도 불구하고 딥시크(DeepSeek)는 미국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AI 분야는 세계 1위지만, 제조업과의 결합 모델이 부족하다. 40~50년 전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한 탓이다. 중국은 세계 최강 제조 기반에 'AI+'를 더해 초강력 제조업을 구축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중국 'AI+'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지만, 15% 관세 외에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 약속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조선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는 셈이지 한국이 받을 실익은 불투명하다.
미국은 AI가 강하지만 제조업이 약하고,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지만 AI가 약하다. 한국은 대미 투자 대가로 미국 AI와 한국 제조업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 생산성을 50% 이상 끌어올리면, 미국의 제조 부활과 한국의 관세·투자 부담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시대는 평범한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일하는 시대가 아니다. 괴짜 천재 한 명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시대다. 정형화된 생산활동은 4.5일 근무가 아닌 AI와 로봇이 007로 운영하는 다크 팩토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에서 이미 시작된 이 추세는 한국 제조업을 위협한다.
노동 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 없이 이뤄지면 비용 증가와 생산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중국의 007, 다크 팩토리가 한국을 공격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은 이를 이길 모델, 미국 AI와의 융합, 자체 스마트 팩토리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설 자리는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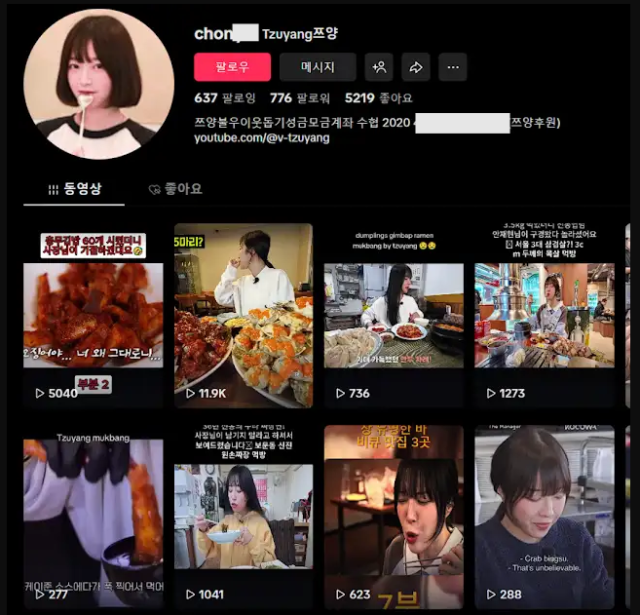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