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꺼졌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장시간 통합을 두고 머리를 맞댔으나 무산된 전례를 고려하면 실질적 통합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거푸 실패에도, "통합 찬성" 이철우 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추진 시·도 인센티브안을 발표하자, 곧장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은 재정지원 성격"이라며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대로 지원하고 별도로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TK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개발 ▷북부권·동해안 개발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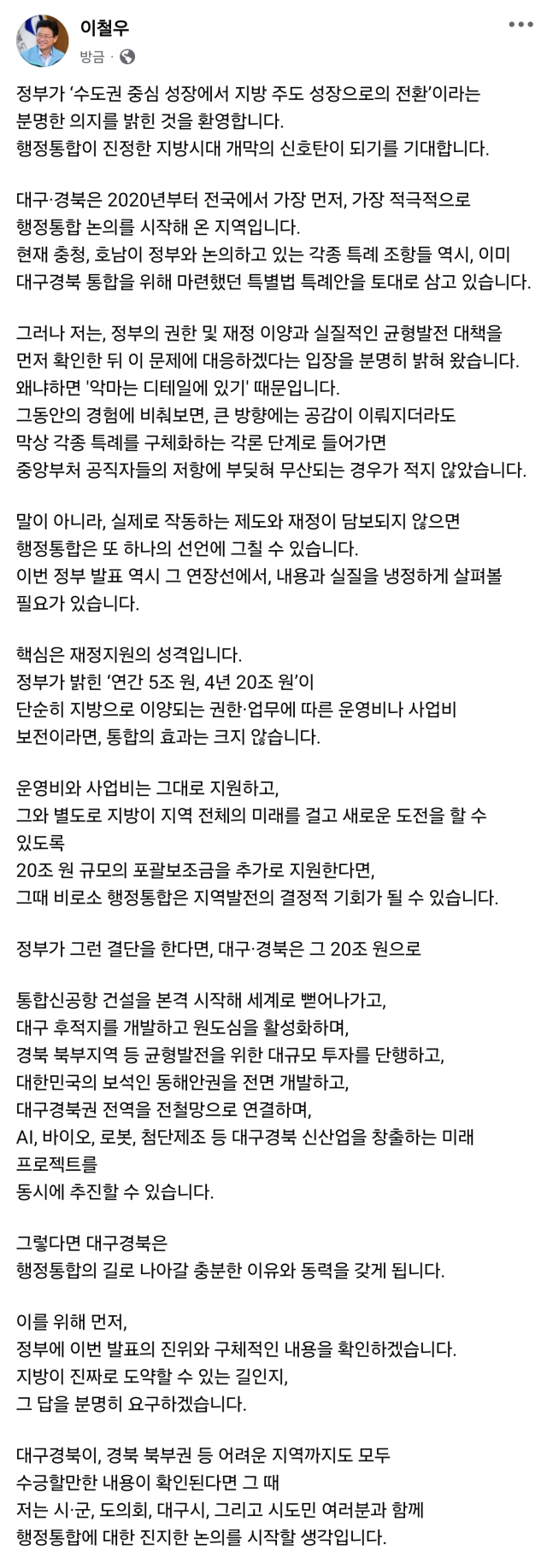
다음 날(17일) 그는 "낙후지역이 피해를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균형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초선 임기부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재정 확보를 통해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립이나 영일만항 확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공항·공항 후적지 개발, 북부권·동해안 개발 등 추진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현 정부가 4년 간 2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당시 TK와 부산·울산·경남 등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TK 통합은 끝내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앞서 통합 문제가 논의와 무산을 수차례 반복하며 이슈가 됐지만 결국 '요란한 빈 수레'처럼 알맹이는 없었다.

행정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도시 명칭, 청사 위치 등 이었다. 대구시는 제1·2·3청사(대구·포항·안동) 개념을 주장한 반면, 경북도는 '행정수도'(안동)-'경제수도'(대구)로 맞섰다. 통합 지자체 명칭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사 위치나 통합지자체 명칭을 두고선 대전·충청권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통합 논의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또 한번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난관은 무엇?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군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합 찬반을 두고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거칠게 드러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한 점도 문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기 쉽지 않아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충분한 논의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속도전을 펼치는 실정이다. 부산·경남에선 '4월 3일 주민투표 완료→5월 특별법 국회 통과→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초단기 로드맵도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특례'를 선뜻 내줄 것이냐도 통합 최종단계에선 중요해진다. 전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나 통합 논의가 끝내 무산된 건 특례에 대한 의견 차 때문이었다. 당시 경북도는 249개의 권한·특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계엄과 탄핵 등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특례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