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차의 트렁크 뚜껑을 힘껏 민다. 차가 천천히 갓길로 빠진다. 갓길에서차가 멈춰선다. 나는 손을 털고 주머니에 꽂는다.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본다.시골에 살때, 눈 오는날은 즐거웠다. 햇볕이 나면 산과 마을이 온통 하앴다.하늘은 더 파랬다. 까치가 감나무에서 울었다. 눈을 뭉쳐 까치에게 던졌다.까치가 나뭇가지를 떠날때, 눈가루가 떨어졌다. 나는 뭉친 눈을 솜사탕처럼먹었다."시우씨, 들어와요. 요즘 눈은 공해 찌꺼기예요"
노경주의 말에, 나는 하늘로 한껏 벌린 입을 다문다. 나는 차문을 연다."눈을 털구 들어와야지요"
나는 눈을 턴다. 산골에 살때, 할머니도 그런 말을 했다. 눈을 털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 눈은 물이 되었다.
"어차피 차가 못굴러가니 우리 얘기나 해요. 내가 묻는 말에 분명한 대답을해야 해요. 머리를 끄덕이거나 흔들지 말구, 예,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그럼 내가 묻겠어요. 온주 그 식당으로 가기전 여기서 깡패로 있었다면서요?""예……아니오"
식구들은 깡패란 말을 쓰지 않았다. 조직, 또는 식구라 불렀다. 남들은 우리조직을 최상무파라 했다. 우리식구는 종성시 북구 유흥가를 터삼았다."한가지만 대답하래두……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했나요?""기도"
"문지기 말이예요? 어디서?"
"호텔, 지하실…"
"나이트클럽?"
"예"
-형, 봐요. 시우 쟤가 한몫 하잖아요. 사람을 기똥차게 집어내거던요. 특히색상에 밝아요. 아까, 갈색 마후라한 놈 들어왔느냐고 물으니 금방 맞추잖아요. 귀두 아주 밝아요. 우린 눈치 못챘는데 바깥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냄새두 잘 맡구. 설렁탕과 닭곰탕을 냄새로만 분별하죠. 기요가 돈필형에게 말했다.
"무슨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도 여러 갠데?"
"황금…"
"아, 황교동에 있는 썬호텔 지하. 거기서 얼마 있었나요? 참, 숫자에는 잼뱅이지. 그럼, 거기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역추적을 하면 정선을 떠난 햇수를 맞힐수 있을테니"그만 물어요, 하고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뭘꼬치꼬치 알고 싶어 한다. 그냥 나를 나로 보면 될 터이다. 이름을 묻는다.나이를 묻는다. 고향을 묻는다. 뭘 하느냐를 알고 싶어한다.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데. 아들이 학교에서 가정조사표를 가져와, 아버지께 물었데. 직업란에 뭐라고 써야 하냐구. 아버지가 귀찮아서 수산가공업이라고 말했다나. 우리가 수산가공업자 맞지? 멍텅구리배에 있을때 강훈형이 잡은 새우에 소금을 뿌리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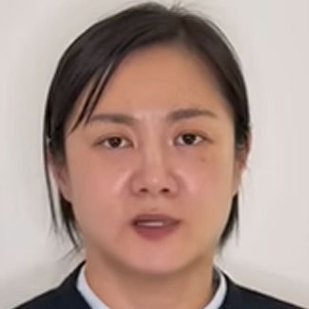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