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산업기반 구축 및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산업단지 신설은 절대적 요구조건이다. 값싼 산업단지가 있어야 도심공장의 이전은 물론이고 기업유치, 기존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6개의 기존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총면적은 584만평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82%밖에 되지않는다. 대구는 전국 16개시도중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가 범시민적으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매달리는 것도 이같은 절박한 심경을 배경으로하고 있다. 매일신문과 대구경실련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시민들은 위천단지 조성을 대구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
문희갑대구시장은 95년과 96년 공약사항인 위천단지,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차례로 발표했다. 민선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계획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경제난 등 외부적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산업단지 지정 추진의 엉성한 방법론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대구시는 위천단지 규모를 당초 300만평(97년 210만평으로 조정)으로 잡았다. 자동차산업과 정밀기계,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페놀사태 등 낙동강오염사고를 겪은 부산·경남지역 민간환경단체 등이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이때부터 단지지정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대구와 낙동강 상류에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맞부딪쳐 5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구는 단지 조성의 전제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해말까지 5천291억원(2001년까지 9천여억원)의 하수처리 투자비를 쏟아붓고도 닭쫓던 개와 같은 입장이 되고 말았다.
위천단지 지정 지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거때마다 부산·경남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몸사리기에 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안이한 접근, 매끄럽지 못한 대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흘려들을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해에야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단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낙동강수계 5개 자치단체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였다. 오는 9일 대책위 4차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타결책이 나오기까지에는 전도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문시장은 연말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지방공단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포기성 발언을 던져놓고 있다.
구지지방산업단지는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쌍용그룹은 지난 95년 연고지역인 달성군 구지면 일대 82만평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전용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96년말 공정 35%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엔 경영권이 대우그룹으로 넘어갔고 대우-삼성간 빅딜로 한차례 곡절을 겪은후 지난달 21일에야 겨우 대구시가 이행강제를 위한 조건부사업승인을 내줬다.
대우는 오는 9월쯤 공사 재개에 들어갈 예정이나 자금조달 등이 쉽지 않아 앞일을 장담키 어려운 형편이다. 대구시도 여건변화 등으로 다시 개발이 지연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계는 위천단지 조성과 관련, 대구시의 수년간에 걸친 안이한 대응을 공박하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없어 공장용지난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파탄이 우려되는데도 대구시는 정부가 떡을 갈라주기만 기다려왔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부산·경남지역 환경단체 등을 초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정부, 대정치권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영재 경일대교수는 "위천단지 지정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검토없이 전시용 정책기획을 한데서 비롯됐다"며 "이 때문에 대구시의 대내외 신뢰도 하락과 지역 경제 낙후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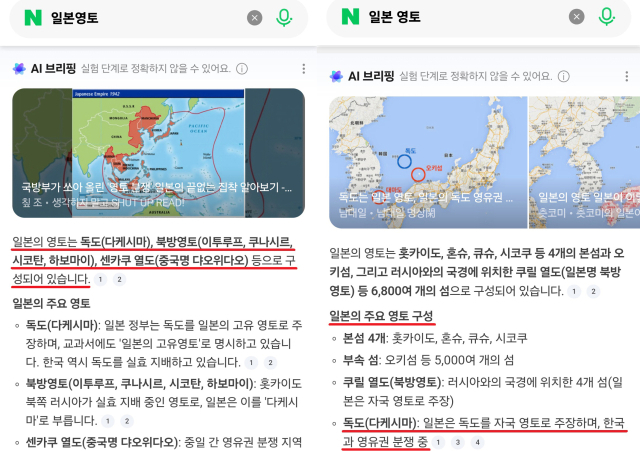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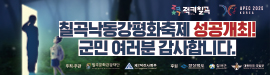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