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퇴계와 낮 퇴계는 따로 있다 한다.
근엄한 주자성리학의 도학자인 퇴계 이황(李滉·1501~1570)도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퇴계를 근엄한 도학자로서의 '낮 퇴계'로만 보고자 했던 것은 그를 성인화하고자 하는 욕망의 소산이었지, 퇴계 자신은 결코 아니었다.
퇴계를 논한 각종 연구업적, 혹은 그의 문집이라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정말 이 같은 삶을 살다가는 1년이 못돼 말라 죽고 말리라." 그만큼 퇴계학은 퇴계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탈색시켜 버리고 말았다.
퇴계가 은퇴해 안동 도산에 머물던 57~66세까지 약 10년 동안 도산을 무대로 쓴 시 40제(題) 90수(首)를 모은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영남대 이장우 명예교수(중문학)와 장세후 박사가 함께 현대어로 옮기고 풀어쓴 '도산잡영'(을유문화사 펴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달에 출판되었다가 몇 군데 오류가 발견돼 전부 회수, 다시 선을 보인 것.
이 교수는 이 책에서 "퇴계가 유학자로서 표면적으로는 불교와 노장(老莊)을 배격하고 있지만, 시에서 쓴 전고(典故)를 보면 장자(莊子)나 신선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없이 인용하고 있다"며 퇴계의 시를 역주하면서 느낀 한 가지 의문을 말하고 있다.
왜 퇴계는 불교를 얘기하면 안 되고, 노장을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인가? 퇴계가 불교를 이야기하고 노장을 끌어대며, 신선을 논한다 해서 그것이 왜 이상하단 말인가? 그런 퇴계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이는 그만큼 지금까지의 퇴계학이 퇴계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쏙 빼어버리고 도학자로서만의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퇴계상(像)을 구축한 단적이 증거가 된다.
사단칠정론에서도 퇴계는 존재하지만, 제자를 위해 성(性) 상담을 해 주는 퇴계도 엄연히 퇴계인 것이다.
역자들은 "이제 퇴계학은 저 천상의 구름 위에서 고고하게 노니는 퇴계를 지상으로 내려야 하고, 퇴계에 대한 찬양 혹은 현창 일색인 그의 문집이 퇴계의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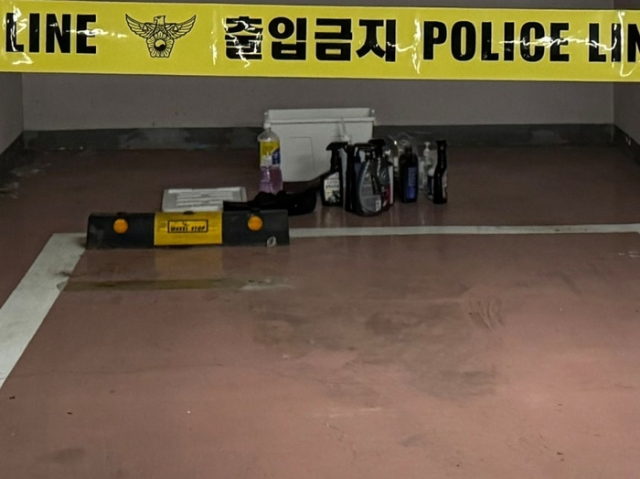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