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기 할리우드 영화는 '벤허' '닥터 지바고' 등으로 전 세계를 평정했다.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시장의 85% 이상을 독과점해 오는 동안, 각국의 영화 산업은 황폐해졌다. 영국은 자국 영화 점유율이 14%, 독일은 8%, 멕시코 10%, 호주와 캐나다 3% 등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대열에서 빠졌다.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등이 흥행 대박을 이루면서 점유율을 59%까지 올렸다.
◇문화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인 문화 정책으로 손꼽힌 스크린쿼터제(국산 영화 의무 상영 일수)를 사수한 덕분이었다. 한국 영화는 의무 상영 일수라는 우산 아래 상영관 확보에 성공했고, 때맞춰 생산된 흥행 대작들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손잡고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상대로 문화 다양성을 위해 나라별 문화 보호 조치를 인정하자는 협약을 유도, 148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스크린쿼터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다.
◇문화 다양성 협약에 반대한 두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FTA의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시켰다. 네티즌들도 스크린쿼터 사수를 영화인들의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과연 한국 영화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여전히 취약하기 그지없다. 우선 예술 영화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실험적인 영화를 제작해도, 흥행성에서 밀려 상영관을 잡지 못하는 게 비일비재다. 멀티플렉스들이 장사가 되는 영화를 몇 개 관이고 동시에 내걸기 때문이다. 스타들이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외제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으며 영화제 시상식으로 들어설 때 충무로의 영화 스태프들은 주린 배를 거머지고 있다.
◇한국 영화의 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없을까. 우선 정부는 영화표의 5%를 영화 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안일한 발상부터 없애야 한다. 건강한 문화적 자생력을 가진 대중을 키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 예술 및 실험 영화를 원활하게 배급하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영화인들도 언제나 부모의 보호를 받는 부잣집 아들과 같은 나약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영화계가 더불어 살며 좋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 영화인들 스스로도 찾아 봐야 한다.
최미화 논설위원magohalmi@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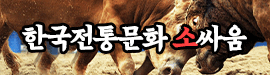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