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 남부동에서 남천을 끼고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길 일대에는 여러 채의 한옥과 근대 가옥들이 옛 정취를 지키고 있다.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월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 이따금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쏟아지는 햇살 아래 잔잔히 물결치는 기왓골이 언뜻언뜻 보인다. 고색창연한 집은 아니지만 시내 한가운데서 만나는 기와 지붕은 세월의 풍파 속을 유유히 유영하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의 등지느러미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진다.
청과시장으로 가는 길도 그렇다. 근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발관과 양복점, 백화점들, 차창을 열고 구경하느라 잠깐 정신을 놓다 보면 뒤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부랴부랴 신호등을 쫓아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음먹고 날을 잡아 서상동과 삼남동 일대를 돌아보았다. 드문드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옥들, 그 사이에 무너져 내려앉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가 보았다. 튼튼한 기둥과 서까래, 대들보엔 1948년에 준공했다는 기록이 당당히 적혀 있지만, 수년 동안 방치되었는지 마당엔 키 큰 잡초가 수북하고, 구석마다 깨진 옹기 조각과 쓰레기가 뒹굴고 있다. 방 문틈으로 들여다본 천장과 지붕은 내려앉아 하늘 한구석이 훤히 보인다. 깡패 같은 세월이 제멋대로 물어뜯고 휘둘러놓은 흔적이다. 담벼락 옆의 찌그러진 3층 토끼장만이 도란도란 정겨웠을 이 집 식구들의 한 시절을 말해주고 있다. 1970, 8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신식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밀려 한옥은 노후 불량 주택으로 인식되어 주인에게서조차 버려져 왔다. 마루에 내려앉은 햇볕마저 서글퍼 보이는, 퇴락한 집의 마당을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온 국민이 신토불이를 외치며 무공해와 유기농, 국산 먹을거리를 열심히 따지고 찾아다니면서 유독 주거 공간만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철저히 서구식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 식생활에서는 전통 건강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을 재료로 만든 한옥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사실은 왜 굳이 외면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휘어져 있지만 튼튼한 대들보와 서까래, 흙에 짚을 섞어 넣고 그 위에 회칠을 한 벽, 콩기름을 먹여 윤기가 나는 온돌방과 시원한 대청마루, 한지를 바른 미닫이문으로 어른어른 비치는 빛과 소리들을 사람들은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 흔히 엉망인 글씨를 두고 쓰는 괴발개발이나, 꿔다놓은 보릿자루를 뜻하는 숙맥, 쇠털 같이 많은 나날이니 하는 말들이 다 농경시대 한옥구조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한다.
초고층 아파트와 콘크리트 도시를 자연으로 인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왓골을 쫑, 쫑, 쫑, 옮아앉는' 박남수의 '새'의 정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처마 아래 둥지 튼 흥부의 제비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때 북적거리며 흥했을 소박한 점방과 방앗간, 적산 가옥들, 개발 논리에 밀려 언젠가 포클레인이 찍어 내린다면 한입거리도 되지 않을 이 조그만 집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운 좋게도 삼남동에 위치한 안 부잣집을 만났다. 세 들어 사는 할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안 부자는 이 근방 일대에서 소작료를 바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산 최고의 부자였다. 500평(1천653㎡)이 넘는 집, 경주 최 부잣집 못지않은 곳간, 그런데 하늘로 솟구치던 용마루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지붕에는 임시변통으로 '갑바'를 덮어씌워 놓았다. 숨 쉬어야 할 한옥 지붕의 숨통을 꽁꽁 틀어막아 놓은 셈이다.
정신이 거취를 정하는 곳이 육체라면, 사람이 거처하는 집 역시 몸에 비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쇠락해가는 지방 유형문화재들을 경산시가 적극 매입해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국민성(?) 때문인지 옛 것들이 점차 세월 속에 잠겨 사라져가고 있다.
서영처(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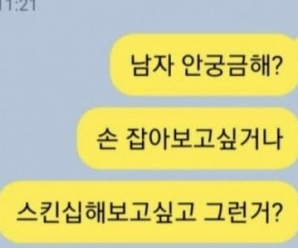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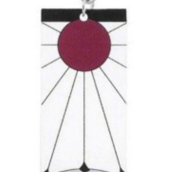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