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새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될 정도로 그 명성이 이젠 한국을 넘어섰다. 가장 한국적인 고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옛길'이라 하면 문경새재가 대명사다.
그런 국민관광지 문경새재에도 도계가 있었다. 3관문을 경계로 충북 괴산군 연풍면 고사리 마을이 문경새재 고갯길에 포함돼 있는데 관광객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여행을 즐기고 주민들 또한 경계심이 없다.
'문경새재 제3관문인 조령관 지붕의 빗물이 고사리 마을 쪽으로 떨어지면 남한강으로 흐르고, 문경 2관문 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이 흥미롭다.
1995년부터 2년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았고, 충북에서 진입하는 관광객은 괴산군에서 입장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입장료가 없다.
주민들은 "괜히 양측의 입장료 징수로 인정 넘치는 이곳 마을 정서와는 달리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줘 미안할 따름이었다"고 했다.
옛길 그대로가 큰 매력인 문경새재는 도립공원 입구에서 3관문까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지만, 포장길인 충북 쪽에서는 고사리 마을과 3관문 입구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문경새재 입구에서 3관문까지 걸어갔다 오려면 왕복 15㎞나 되니 걷기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충북 괴산군 연풍면 '이화여대 고사리수련관' 쪽으로 차를 타고 3관문 입구에서 1관문으로 내려가면 쉽게 걸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문경새재는 3관문부터 역코스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사리 마을 덕분이다.
◆경상도 끝, 상초리 마을과 동화원(東華院)
경상도 끝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마을은 관문안의 혜국사까지 포함해 도립공원 안이지만 46가구 87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상초리 마을은 원래 현재의 드라마 촬영장 자리에 있던 마을이었으나, 1996년 문경새재 도립공원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상가 밀집지역으로 집단 이주했다.
조금 더 끝에는 동화원이 있다. 문경새재 3관문 바로 밑이다. 지금은 휴게소로 길손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다. 예나 지금이나 길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역할은 변함이 없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20가구 정도가 살던 마을이어서 조령초교 동화원 분교까지 있었다. 이들은 주변 구릉지와 비탈을 일궈 화전민으로 살았다고 한다. 70년대 이후 화전민 이주 정책에 따라 모두 외지로 떠났고, 지금은 한 가구만 여행객들을 상대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경새재의 충청도 고사리 마을
경상도 땅은 아니지만 문경새재의 굽잇길을 따라가다 3관문을 넘어서면 충북 괴산군 연풍면 고사리 마을에 닿게 된다. 옛 신혜원이라는 원(院)이 있던 곳이다.
고사리 마을 역시 문경새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곳으로, 경상도와 충청도 문화가 문경새재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지점이다. 이 마을의 현재 명칭은 원풍리이지만 고사리(古沙里) 마을로 더 잘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은 조선시대 연풍현 고사리면(古沙里面)이었을 만큼 큰 마을이었다.
문경새재가 도립공원이 되면서 넓은 농토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고사리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 대부분 외지로 나갔다. 현재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제외하면 20가구 정도 본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10집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마을 수호신인 산신과 동네 수구맥이에 동고사를 매년 거르지 않고 두 번씩 지내면서 마을의 공동체 관념을 확인하고 있다.
원(院)은 조선시대 때 길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을 매 놓고 여장을 풀던 곳이다. 이곳에서 길손들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 문경의 유곡역을 지나 험로로 접어드는 문경에는 이런 원이 많았다. 문경새재만 해도 조령원, 동화원, 신혜원 등 3개의 원이 있었고, 충청도 쪽 신혜원도 그중 하나로 번성했던 곳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마방터라는 민박집이 옛 원의 마방터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고사리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종언(79) 씨는 "충청도에서 문경새재로 가는 길은 '박정희 미화도로'다"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교편을 잡았던 문경초교와 하숙집인 청운각을 둘러보고, 문경새재를 걸어서 넘어 이 고사리 마을을 거쳐 수안보에 도착했다. 그리고 수안보에서 1박을 하고 청주로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주에 가서 도지사한테 '문경새재를 넘으면 찻길이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 소로(小路)더라'라고 했어. '그것이 내 맘에 찌더라' 했더니 도지사가 천불이 났어. 각중(갑자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장비가 오고, 돌재이(석공)가 와서 돌을 깨고 난리가 났어. 3관문 밑 길옆에 식당이 하나 있지, 거기까지 길을 닦아 올라가다가 대통령이 서거했지. 그 바람에 이 길은 닦다 말았어."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상도 쪽 문경새재는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에 왔다가 "이 길은 차가 못 다니게 보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
법보다 앞서던 통치(統治)시대를 거치면서 경상도 쪽 문경새재는 '자연 그대로' 보존됐고, 충청도 쪽은 '인공'이 즐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옥길과 문경새재
이 씨는 고사리 마을에서 태어나 동화원에도 살다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아버지가 8세 때 돌아가시고 동화원에 살 때 문경초교를 6, 7개월 다니다 말았다고 했다.
"여기가 경치가 좋은께(좋으니까) 김옥길 문교부 장관이 이곳에다 별장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했어. 날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는데, 아깝게도 70살에 돌아가셨어. 저 앞에 신성봉 밑에 산자락 27정보(8만여 평)가 모두 이화여대 땅이여. 이화여대 수련관인데, 김옥길 장관이 다 꾸며놓고 갔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최규하 과도정부 시절 문교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김옥길 장관의 별장 '금란서원'(金蘭書院)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금란서원은 마방터 위 우거진 소나무 숲속에 자리해 언뜻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서면 단아한 집과 마당이 숲과 어우러져 있다.
김옥길 전 장관은 1921년 4월 17일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나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미국 웨슬리언대와 템플대학원을 마쳤으며, 1961~1979년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고 10'26사태 직후인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까지 문교부 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이쪽과 저쪽이 다르지 않은 문경새재
고사리 마을에는 화려한 휴양림과 펜션, 음식점들 뒤 안에 이 마을을 지켜 온 20여 채의 집들이 초라하게 꺼져 있다. 돌담과 슬레이트 지붕에 파란 칠을 한 모습이 시골 아낙이 화장하고 장에 나선 것처럼 어색하기까지 하다. 마을 들머리에는 350살이 넘은 소나무 당목이 있고, 그 아래에는 고사리면(古沙里面)에서 세운 애민선정불망비(愛民善政不忘碑)가 부러진 채 귀부 위에 세워져 있다. 이곳에 있는 마을자랑비에는 신혜원에 널다리가 놓여 있어 판교점(板橋店)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문경새재나 고사리 마을에서는 할머니 몇 분만 모이면 잘 부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문경새재 아리랑을 몇 마디씩은 다 부르고 있었다. 특히 문경새재 아리랑비에 새겨 놓은 원사설 그대로를 구성지게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문경아 새자는 윈 고갠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나네.' 몇 해 전에 이곳에 살다가 돌아가신 송영철 할아버지가 구성지게 부르던 문경새재아리랑 사설이다. 왜 이 고개가 있어, 그것도 이 고개가 왜 이리 구절양장(九折羊腸)이 되어서 사람 살아온 모습과 이리도 닮았는가?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조격인 문경새재아리랑은 현재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문경시와 문경문화원은 대중화와 재조명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 전통민요인 아리랑을 맨 처음 악보로 만들어 서양에 소개하기도 한 미국인 선교사 H. B 헐버트는 1896년'조선유기'에서 "아라릉 아라릉 아라리오 아라릉 얼싸 배 띄어라/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아리랑에 대해 기록했다. 진도아리랑의 첫 사설도 '문경아 새재야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고 부르고 있어 원조격인 문경새재아리랑이 타 지역 아리랑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새재를 넘어 문경장에서 장을 많이 봤다. 연풍장이나 수안보장도 있지만 문경장이 더 커서 물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에서 경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행정에서는 굳이 문경새재를 '조령'(鳥嶺)이라 표기하면서 경상도와 충청도를 나누고 있지만….
문경새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는 이쪽 저쪽이 다르지 않았다. 끝과 끝이 만나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다. 양쪽 주민들은 문경새재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서로에게 모두 덕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고성환 시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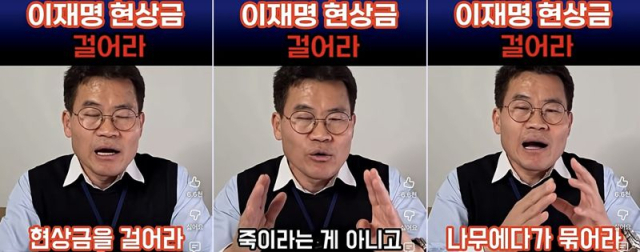


 ">
">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北 고 김영남,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확인 전화에 '곤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