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젠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올라오던 분이 동성로의 한 재즈바에서 고(故)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나지막이 부른 일이 있다. 나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자 그는 내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 노래의 참맛을 알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 그날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이를 먹으면서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공감하고 있다. 어려서는 받아쓰기 100점을 받지 못하거나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급우가 이해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과학을 어려워하는 나 자신을 보며 어린 시절 급우들을 이해하게 됐다. 하나를 이해한 대신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의 나는 병역 기피자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 입대일이 가까워 올수록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다. 20대 초반, "담배는 끊어도 술은 못 끊겠다"던 직장인이 된 대학 선배들의 말. 당시에는 '쓰디쓴 소주가 뭐 그리 좋을까?'라고 여겼지만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무렵 나도 소주 맛을 알아버렸다. 20대 중'후반에는 허우대 멀쩡하고 직장도 번듯한 대학 선배들이 노총각이 된 게 신기했다. 올 들어 나는 '이렇게 노총각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요즘 깨우친 게 하나 있다. 바로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다. 낡을 대로 낡은 구두, 아들이 입던 재킷을 고쳐 입으시던 모습, 쉰밥도 버리기 아까워하시던 게 궁색해 보이기 짝이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기도를 다녀와서는 "내가 너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는 기도할 게 뭐 있겠느냐"고 했다. 신실한 종교인 혹은 구도자가 아니라 복을 빌러 다니는 듯한 그 속물근성이 싫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어머니는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줄곧 "학점 관리는 잘하고 있느냐?" "착실하게 스펙 쌓고 있느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내가 싫어했던 그 모든 게 당신들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간혹 나잇값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나잇값 한다는 건 '얼마나 타자를 공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누구나 어른이 된다. 반면에 누구나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는 건 어렵다. 몸만 자란 어른아이가 아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참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고민의 첫발을 내디뎠다면 잠깐의 여유를 갖고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의 시선에서 현상을 바라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분노할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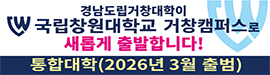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