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불행은 만족을 모르는데서 온다.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 여건에 비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비교하고 비교당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다.
일본 교토의 용안사에 가면 백사정원인 석정이 있다. 백사정원은 물과 나무가 없이 하얀 모래가 깔려 있는 마른 정원인데 이 용안사 석정에는 열다섯 개의 돌이 놓여 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어느 위치에 서도 열다섯 개의 돌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로 자주 해석된다. 또한 있으되 없고, 없으되 있는 묘한 삶의 진리를 보여 주기도 한다. 여기서 보면 있었던 돌이 저기서는 안보이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던 돌이 저기서는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정원을 뒤로 돌아가면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거나 입을 축이는 용도로 쓰이는 물확이 있는데 영락통보처럼 생긴 물확에 '오유지족(吾唯知足)'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해석하자면 '나는 오직 족함을 아노라'라는 뜻이다. 석정의 담도 그렇지만 이끼가 가득 낀 뒤뜰 모서리에서 발견한 이 물확은 석정의 하얀 모래의 고요함과 어울려 순식간에 선정에 들게 했다.
있다 한들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삶의 진리는 석정의 작은 돌에서 드러난다. 보이지 않으니 가질 수 없고, 없다고 하려니 없는 것이 아니다. 결국 마음을 비우는 도리밖에 별 수가 없다. 그리고 손을 씻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 보이는 이 '吾唯知足'네 글자가 만족할 줄 모르던 마음에 채찍을 가한다.
인간의 불행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는데서 시작된다. 상상하는 능력을 타고 난 인간은 현실의 한계를 가볍게 넘어 상상의 세계에서 탐욕을 부풀린다. 밤새 기와집을 몇 채나 짓는다는 말은 바로 이 상상과 탐욕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밤새 지었던 기와집은 아침이 되면 허무하게 허물어진다.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밤새 지었던 기와집이 아니라 내가 거처하는 좁은 집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吾唯知足'네 글자를 서재 방문에 걸어두고 드나들며 본다. 더 큰 탐욕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현실에 족함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불행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다. 천영애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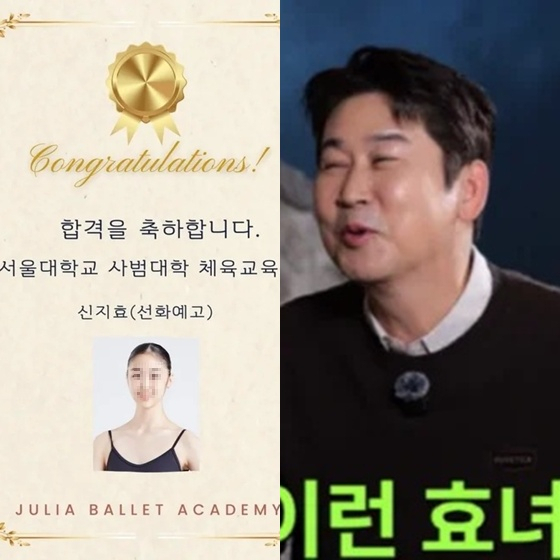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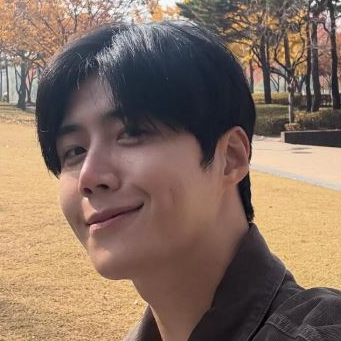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