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이 차차 밝아지니 음력 삼월 첫날이라 아오내장 네거리에 십육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끼고 왔다 갔다 수천 명 군중들이 연속하여 모여들고, (중략) 독립운동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높이 들어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천지가 뒤덮는 듯 강산이 뒤끓어 매봉산이 떠나갈 듯 수천 명 군중들이 시위행렬 전진헐 제 어디서 총소리 쾅 쾅."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의 한 대목이다.
고(故) 노동은 중앙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판소리 명창 박동실(1897~1968)은 일제강점기에 민족 영웅의 항일투쟁을 그린 창작 판소리 '열사가'(烈士歌)를 만들었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이준을 주제로 한 4곡의 열사가는 국민의 민족혼을 일깨웠다.
활발하게 전승되던 열사가는 1950년 박동실의 월북으로 더는 퍼지지 못하고 묻혔다. 후계자들은 한동안 그가 스승이었다는 사실조차 말하기 어려울 만큼 움츠러들었다. 다행히 그 맥은 박동실의 제자와 그들의 제자로 이어지며 가까스로 전승됐다. 월북 예술가들의 작품이 해금되며 1993년 음반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반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인 정순임(77) 명창은 대표적인 열사가 소리꾼으로 꼽힌다. 특히 정 명창의 '유관순 열사가'는 독보적이다. 어머니 장월중선(1925~1998)에게 배웠다. 장월중선은 박동실의 제자다. 정 명창은 유관순 열사가로 1993년 음반 작업에 참여했다.
정 명창의 집안은 3대를 이어온 '판소리 명가'다. 호남 출신으로 1세대인 큰외조부 장판개, 외조부 장도순을 시작으로 2세대인 외숙 장영찬, 어머니 장월중선을 거쳐 본인까지 3대에 걸쳐 전통의 맥을 이어왔다. 특히 장판개는 고종황제로부터 벼슬까지 받은 어전 명창이었다. 어머니 장월중선은 경주에 국악을 뿌리내린 인물이다.
정 명창도 1989년부터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10년간 활동했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시절 그는 매년 3월과 8월이면 유관순처럼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당시 서울 탑골공원에선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한 국악무대가 매년 열렸어요. 주로 유관순 열사가를 완창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는 1시간 30분 길이의 체력 소모가 큰 곡이다.
이 곡을 토대로 직접 창극도 만들었다.
정 명창은 올해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여러 공연에 초대돼 제자들과 유관순 열사가를 부를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엔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4일엔 국악방송 공개홀 무대에 오른다.
"열사가가 묻혀버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이런 노래들이 널리 알려져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노(老) 음악인의 소박한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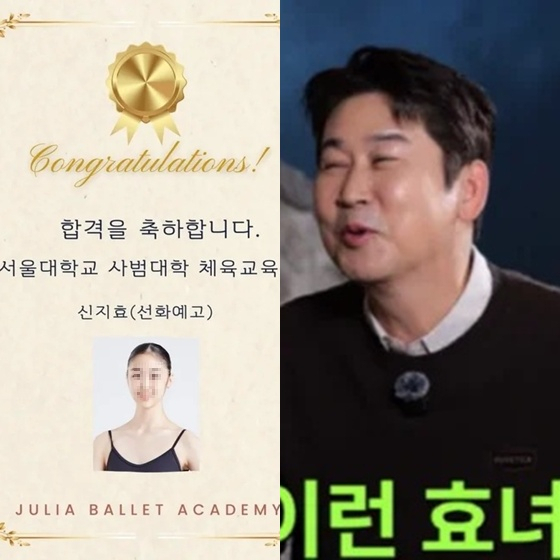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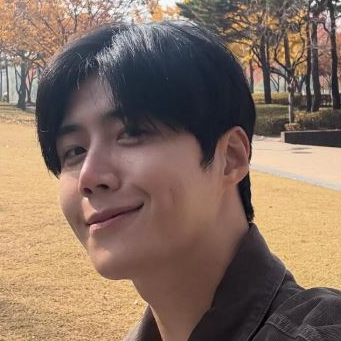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