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구하려 든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위험이나 불행에 처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까. '맹자'(孟子) 고자(告子) 상편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며, 곧 인(仁)이라고 했다.
자신과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도 측은지심이 발휘될까. 중국 후한(後漢·25∼220) 때 양주(涼州)라는 곳에 개훈(蓋勳)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었다. 당시 양주에는 무위태수(武威太守)라는 자가 횡포를 부려 소정화(蘇正和)라는 관리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무위태수의 배후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 지역의 감찰관(刺史)인 양곡(梁鵠)은 오히려 소정화를 죽여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이자 부하인 개훈에게 의견을 물었다. 소정화에게 원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훈에게 이 기회에 공보사수(公報私讐), 즉 공권력(公)으로 사(私)적인 복수(讐)를 하(報)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개훈은 "남의 위급한(人之危) 상황을 틈타(乘)는 것은 어질지 못하다"며 양곡을 설득해 소정화를 죽일 마음을 거두게 했다. '후한서'(後漢書) 우부개장열전(虞傅蓋臧列傳)에 나오는 이야기로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틈타 해치는 행위를 비꼴 때 쓰는 승인지위(乘人之危)의 유래이다. 개훈은 나중에 고위직에 오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듯, 인생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측은지심보다는 승인지위나 공보사수를 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非人). 한 해를 보내며 나는 인간다운 사람이었던가를 묻게 된다. 사람에 따라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시비가 갈린다. 측은지심, 승인지위, 공보사수 가운데 나는 어느 마음일까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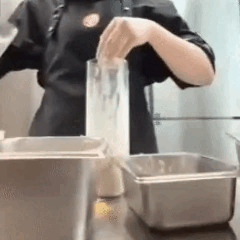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배현진, 故안성기 장례식장 흰 옷 입고 조문…복장·태도 논란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무안공항→김대중공항... "우상화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