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때,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다리 위아래 돌 모양이 왜 정반대에요?"
50여 년 전, 6학년 학생이 던진 이 질문에
당시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천300년 만에
불국사 건축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눈썰미로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대웅전 앞 자하문으로 오르는 돌계단 백운교.
무지개 모양이라 홍예교(虹霓橋)라 부릅니다.
그것도 쌍 무지개. 세계에 딱 하나뿐이랍니다.
왜 이곳에만 유독 '쌍홍예'로 지었을까요?
역 사다리꼴의 돌로 둥글게 쌓는 홍예교.
곡선이 우아하지만 밀어올리는 힘엔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홍예석 위로 둥글게 한 겹 더 감았습니다.
그 가운에 사다리꼴로 끼워 맞춘 홍예 종석 하나.
땅이 솟아도 끄떡없는 '내진설계'의 진수입니다.
또, 계단은 30도 각도로 비스듬히 쌓았습니다.
백운교를 오른뒤 청운교는 일부러 들여쌓기로,
다리를 받치는 돌은 야무지게 스크럼을 짰습니다.
이 모두 자하문 아래 축대가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돌계단을 버팀목으로 계산한 내진 공법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자연석을 톱니처럼 맞물려 쌓은 그랭이 공법.
그 돌마져 삐져나오지 못하게 때려 박은 못돌 공법.
축대마다 돌홈을 파 가구처럼 짜맞춘 결구 공법.
751년, 김대성은 이토록 야무지게 지었습니다.
이런 불국사에 큰 지진이 닥쳤습니다.
1036년, 1038년 서라벌에 잇따른 지진으로
불문 남쪽 대제(백운교 주변), 하불문(안양문 일대)일대
건물이 무너지고 석가탑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구결과 규모 6~6.4, 역대급 강진이었습니다.
신라 107건(삼국사기), 고려 193건(고려사).
조선시대 지진 기록은 무려 2천여 건(조선왕조실록).
땅이 갈라지면 지열(地裂), 흔들리면 지동(地動),
꺼지면 지함(地陷),탑이 흔들리면 탑동(塔動)….
역사 속 이 땅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많은 지진에, 이순신에 약이 오른 왜군의 방화에
건물은 파괴되도 백운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둘도 없는 신박한 내진설계 '쌍홍예' 덕입니다.
'축대가 무너지면 불국사가 쓰러진다'
지진을 간파한 김대성은 분명 천재 건축가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 지진.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 촉발지진에도.
불국사 백운교는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지구촌 숙명. 피할 수 없으니 도리없습니다.
백운교 '쌍홍예'의 지혜를 더 갈고 닦을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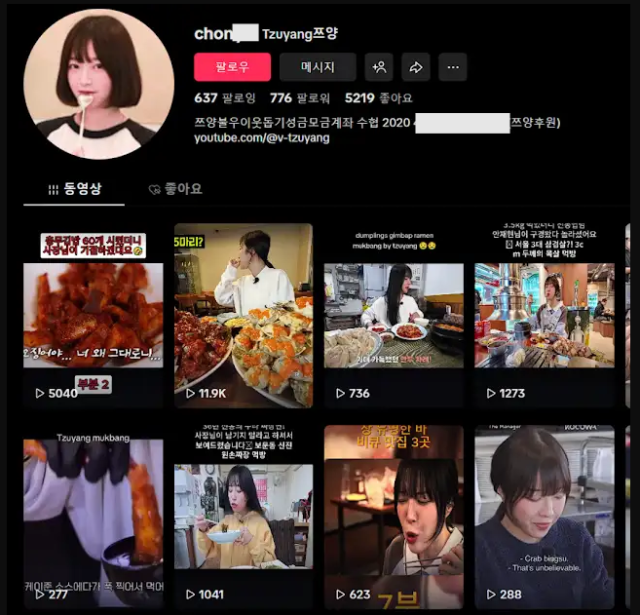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