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주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에서 '무(無)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대학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학과)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 뒤, 다양한 기초과목을 탐색하고 2학년 이후 학과를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의 최대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약 4천426억원, 대학별 76억~155억원)를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과 대구경북의 일부 사립대들이 무전공 선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무전공 선발은 학과 간 칸막이를 허물어, 새로운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개설하는 등 대학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선 전공 선택권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다.
무전공 선발은 장점이 많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학생들이 무전공 선발 취지와 달리 취업에 유리한 특정 전공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 이러면 특정 전공은 교수·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내 불균형은 커진다. 또 가뜩이나 위축된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23일 7개 단체로 구성된 교수연대에 이어 24일 전국 대학 인문대학장들이 "교육부의 무전공 확대 방침이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전공 선발은 현재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2009학년도에 '자유(자율)전공' 형태로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학생 모집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이 정원을 축소하거나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 무전공 선발 확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부작용이 따른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작용 최소화 방안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기본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기초학문 육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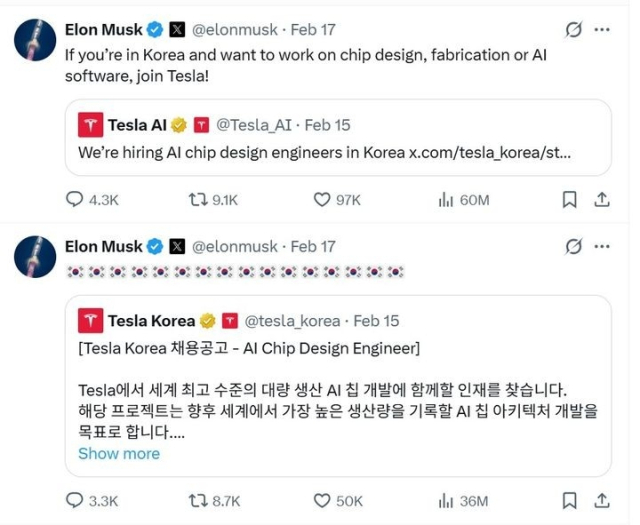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필요했던 것"
대구 하중도, 200억원 투입 전망대 등 설치 관광명소화
"앞에선 '사랑한다'던 XXX" 박나래 前매니저 저격한 주사이모
조국 "李대통령 부동산 개혁, 내 토지공개념과 일치"
[인터뷰] 장동혁에게 "이게 지금 숙청인가?" 물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