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가까운 동물을 마우돈구(馬牛豚狗)라고 한 것은 말, 소, 돼지, 개의 순서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말의 발굽이 닳지 않도록 편자를 징으로 고정시키는 광경을 그린 조영석의 풍속화 '말징박기'다.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숙련이 필요한 이 일을 하는 전문가를 마제사(馬蹄師)라고 한다.
덩치가 큰 동물인 말에게 쇠로 만든 편자를 쇠못인 징으로 박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조영석이 살았던 시절에는 이렇게 했던 것이다. 먼저 큰 나무 옆으로 말을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나무에 고정시켰다. 말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바닥에 눕히는 일, 네 다리를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박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좌우의 앞 뒷다리를 교차시켜 끈으로 묶었고, 모아놓은 좌우의 다리를 다시 하나의 긴 끈으로 묶어 줄 하나에 네 다리가 모두 제어되는 모양새다. 세심하게 그려진 끈을 보면 말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매듭지우는 특별한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장인은 대장간에서 미리 만들어온 편자를 이 말의 발굽 높낮이에 맞춰 줄톱과 낫으로 다듬어가며 징으로 발굽에 박았다. 상투가 드러난 망건차림으로 망치질하는 장인 옆에서 벙거지를 쓴 조수가 긴 나뭇가지로 말의 목을 간질이며 심하게 요동치지 못하게 한다. 값비싼 재산인 말을 보호하려 바닥엔 가마니를 깔았다.
조영석은 사람보다 주인공인 말의 묘사에 더 공을 들였다. 옷은 가는 선으로만 그렸지만 말은 윤곽선 안쪽으로 입체감이 나도록 부드러운 선염을 농담으로 더해 커다란 몸집이 실감 난다. 말의 머리가 휘어지며 솟구치는 모습이나 목의 긴장된 근육, 벌린 입 등이 간결하면서도 생생해 말의 고통스러움이 전해진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말 울음소리를 들으며 사생했을 조영석의 모습이 상상된다. 작은 그림이지만 그림 바깥에 누군가가 써놓은 평이 있어 진귀한 작품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은 그림으로 일찍 나타났다. 그러나 조영석 이전 우리나라 말 그림은 대부분 준마, 명마로 이상화된 말이다. 이렇게 땅바닥에 뉘어져 징을 박히며 고통스러워하는 말이 아니었다. 조영석이 김홍도보다 두 세대 앞서는 선배임을 감안하면 지금 여기 삶의 장면을 그린다는 선구적인 발상, 인상적인 주제의 선택, 풍속화에 어울리는 표현법 등이 더욱 놀랍다.
조영석 이전에 전무했던 이 말 징 박기는 김홍도가 이어받았고, 정조 때 작품인 '태평성시도' 8폭 병풍 중 제4폭에 나오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풍속화첩 '신화무적(神化無跡)'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옛적 삶의 모습이 그림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다. 그래서 조영석의 이 작은 풍속화가 더욱 소중하다.
미술사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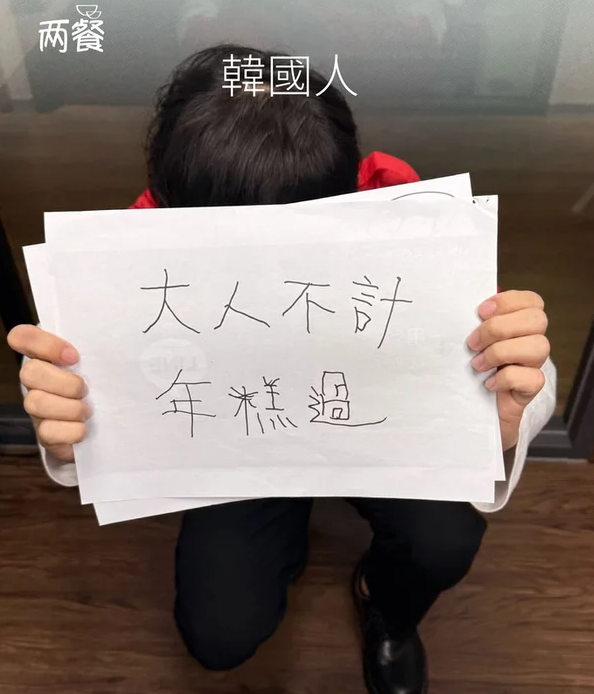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제 생각 추진 어려워" [영상]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통합 무산·신공항 표류…"TK 정치권 뭐했나"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음모론에 '李 탄핵'까지 꺼냈다…'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