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 자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AI 경쟁력은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로 직결되는 전략 기술인 만큼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가 최근 발표한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국가별 '주목할 만한 AI모델' 수는 미국이 40개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5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1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중 양강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로 8년째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세계 AI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주목할 만한 AI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거나 학술 연구 논문에 많이 인용된 모델을 선별한 것으로, 미국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3위인 프랑스(3개)와의 격차도 커 사실상 두 국가를 제외하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경쟁력을 갖춘 AI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는 AI인프라의 핵심 요소다. AI 가속기에 최적화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술을 선점한 엔비디아는 AI 혁신의 중심에 섰다. GPU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 주도권을 쥐고 기술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이 있다.
미국 정부는 AI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자체적으로 칩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장비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압박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한국은 유리한 입장이다. HBM 시장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와 종합반도체(IDM)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칩 글로벌 1·2위 기업이 버티고 있어 공급망이 안정적인 편이다.
유망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의 성장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퓨리오사AI는 AI 머신러닝 작업에 특화된 NPU를 개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협업을 통해 LLM(대규모 언어모델)과 NPU를 결합한 온프레미스 AI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 부문을 국산 기술로 구현하며 'K-AI'의 차세대 대표 주자로 평가된다.
리벨리온 역시 고성능 NPU를 개발해 국산 LLM이 구동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해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태계 구축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 인프라 구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 안정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전력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HBM은 AI 반도체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생 기업의 성장도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AI 혁명은 하나의 기회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팹리스,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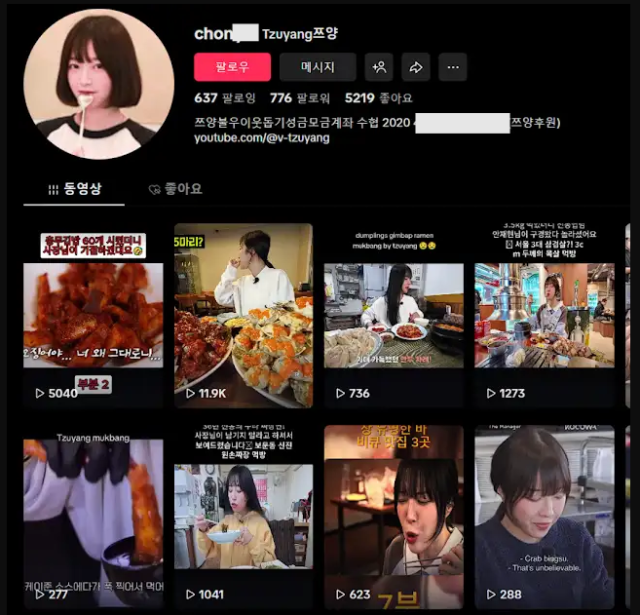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