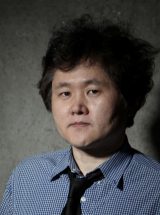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한때 캠코더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가까운 일본 여행길, 어깨에 메고 촬영하던 모습. 세관을 통과할 때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나던 장면까지. 큼지막한 테이프 레코더 형태였지만, 무비카메라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실용적이었다. VHS-C, 8mm, Hi8 같은 테이프 규격이 세대를 가르던 시절. 그것은 장비이자 자랑이었고, 기록이자 표현이었다.
요즘 K-팝 그룹 '뉴진스'가 들고나온 빈티지 캠코더 덕분인지, 낡은 모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고 시장에선 오래된 소니 핸디캠이나 삼성 캠코더가 꽤 큰 값에 거래된다. 해상도나 화질만 보면 최신 스마트폰에 못 미치지만, 사람들은 조금은 흐릿하고 탁한 화면을 다시 찾는다. 흐릿하지만 단단한 질감. 선명하지 않기에 오히려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기억.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감각의 복원에 가깝다.
왜일까. 선명하지 않기에, 더 많은 상상이 그 틈을 메운다. 캠코더 특유의 아날로그 질감, 화면 위를 흐르는 잡음과 번짐, 의도치 않은 떨림과 어긋남은 감정의 여백을 만들어낸다. 기술은 꾸준히 진보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덜 정제된 것에서 더 깊은 울림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영상 작업을 하며 일부러 노이즈와 컬러 번짐을 입혀본 적이 있다. 예전 같으면 피해야 할 요소들이 오히려 화면을 부드럽게 감싸안았다. 너무 또렷해서 낯설기보다는, 흐릿해서 마음 편한 장면들이 있었다. '복고풍'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된 데에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선 감정이 스며 있다. 그것은 '회상'이 아니라 '그리움'에 가깝다.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는 것이다.
테이프를 넣고 'REC'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했던 캠코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지만, 그 시절엔 버튼을 누르기 전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다. 찍을 것인지, 남길 것인지, 정말 필요한 순간인지. 그 고민이 영상에 담긴 마음의 깊이를 만들었다.
캠코더를 든 사람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장면의 해석자이자 감정의 수집가였다. 떨리는 손끝, 조심스러운 줌인, 화면 밖 들리는 숨소리까지도 기록의 일부였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장의 이미지를 찍고 지우지만, 그 시절 캠코더에 담긴 영상은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선택된 기억이었다.
기술은 분명 나아졌지만, 기억은 종종 뒤를 돌아본다. 중요한 건 픽셀이 주는 선명함이 아니라, 그때의 숨결과 공기, 말없이 바라보던 눈빛, 겸연쩍게 돌아선 뒷모습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다시 오래된 캠코더를 손에 드는 이유도 결국, 그 감각,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어깨에 메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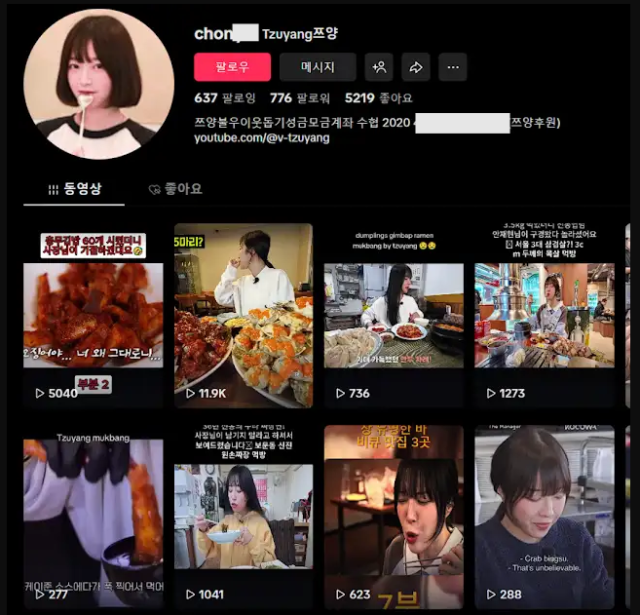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