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주시경(周時經)은 '언문'으로 비하되던 우리 글자를 '큰 글'이라는 뜻에서 '한글'이라 불렀으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웹스터·옥스퍼드·브리태니커 등 웬만한 사전이나 백과사전에도 'Hangul'로 올라 있고, 그 우수성 역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말글로 학문 하기, 우리 학문 하기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문학·국학·한국사 등 일부를 빼고는 남의 말로 하거나 남의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베끼기 학문'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무분별한 외래 이론의 수입이 부른 지식의 식민지화는 오랫동안 지식인 사회가 고민해온 화두였음은 사실이다. 심지어 외국 이론의 '대리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서구 이론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받아들여지는 형편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런 현실에 지레 머리를 조아려 혓바닥까지 갖다바치자는 영어공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이니 한심할 따름이다.
▲학계 중진 140여명이 '우리말로 학문하자'는 기치 아래 자생적 학문을 추구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발기인 대회를 가진 '우리말로 학문 하기 모임'은 문학·역사·철학·예술·사회·문화·종교·언어에 걸쳐 우리 길 찾기에 나선 셈이다. '우리는 삶과 앎, 일상과 학문, 실천과 이론이 괴리된 궁핍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이들은 세미나·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말로 학문 하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아픈 말은 '우리말로 철학 하기'였다. 지난 6월 우리사상연구소가 주요 구성원을 중심으로 알차게 이 운동을 벌여 '우리말 철학사전' 1권을 펴내면서 논의의 범주와 그 영역을 크게 확대해 이번 운동이 일게 됐지만, 그간 우리말로 철학 하기가 안 돼 있었다면 '생각은 무엇으로 했을까'를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모임은 그간 서구 이론의 범람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 사이를 지나치게 경쟁과 투쟁의 관계로 왜곡시켰다며 한국적 정서에 맞는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우리 말글로 창작되는 문학마저 비평과 이론은 외국 것 베끼기나 외래종 들여오기 위주인 현실에서 이 운동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 찾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딱딱한 논문집을 떠나 제대로 학문하는 자세, 학문 글쓰기의 참된 본보기가 나온다면 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태수 논설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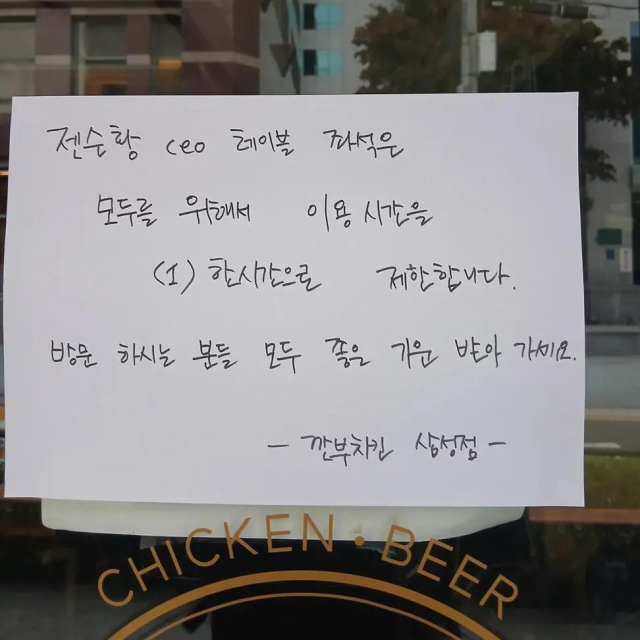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