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입은 여자 / 김기택
탱탱한 피부처럼 살에 착 달라붙은 흰 셔츠를
힘차게 밀고 나온 브래지어 때문에
그녀는 가슴에 알 두 개를 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간혹 팔짱을 끼고 있으면
흰 팔을 가진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처럼 은은한 빛이
그녀의 가슴 주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알에서 태어나 나라를 일으켰다는 고주몽이나
박혁거세의 후손들이 사는 이 나라에서는
복잡한 거리에서 대낮에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드문 일도 아니다.
길을 가다 멈춘 남자들은 갑자기 동그래진 눈으로
집요하고 탐스럽게 그녀의 가슴을 만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그 눈빛들을 햇빛처럼 쬐었다.
타조알처럼 두껍고 단단한 껍질 속에서
겁 많고 부드러운 알들은 그녀의 숨소리를 엿들으며
마음껏 두근거리고 있었다.
가슴에서 떨어질 것 같은 알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그녀의 허리가 너무 가늘어 보였지만
곧바로 넓은 엉덩이가 허리를 넉넉하게 떠받쳤다.
산적처럼 우람한 남자가 부리부리한 눈으로
아기를 안고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또 알이다. 등단 작품인 '꼽추'에서 혹을 난생설화로 연결한 시인이 아니던가. 남자에서 여자로, 등판에서 가슴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알 속에서 숨쉬는 말랑말랑한 생명을 끄집어내는 발상은 변함이 없다.
이런 무슨 허튼소리. 솔직히 내 관심은 오로지 가슴, 아니 유방. 사람에게 유방이 달려 있다는 사실, 게다가 두 개씩이나 달려있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니고 뭔가. 경주 천마총의 고분군처럼 불룩한 유방이 대지가 아닌 사람의 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유가 끝나고 나면 사그라지는 동물들과는 달리 호모 사피엔스는 죽을 때까지 유방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기적이기 때문일까, 남자들은 가던 길 멈추고 "갑자기 동그래진 눈으로/집요하고 탐스럽게 그녀의 가슴을 만"진다.
봄볕처럼 따스한 햇살 쏟아지는 십이월 창공에 불룩하게 달려 있는 저 '청천의 유방'(이장희), 땅에는 날선 창끝 같은 가슴을 세우고 티셔츠 입은 여자들이 보무당당하게 내 앞을 지나간다.
장옥관(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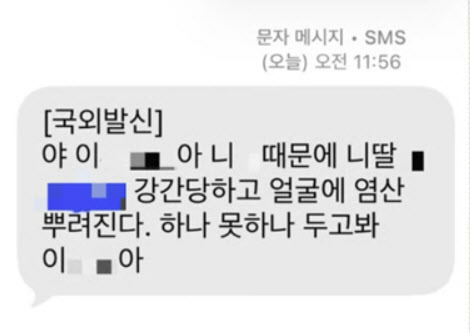

![[속보] 경찰, 쿠팡 로저스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조사](https://www.imaeil.com/photos/2026/02/05/2026020517375601025_l.jpg)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
배현진, 왜 윤리위 제소됐나 봤더니…"사당화 의혹"